앤드루 포터 세 번째 소설집 ‘사라진 것들’
흐르는 시간 속 중년의 상실 그린 작품들
“문학이 주는 자기 발견의 기쁨과 고통”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이어 신작 '사라진 것들'을 쓴 미국의 소설가 앤드루 포터. 촬영 Sarah E Cooper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것만이 불변의 명제인 유한한 생의 공허함이 그 자체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되리라는 미지근하다 못해 서늘한 위로를 건네는 소설가 앤드루 포터. 그가 소설집 ‘사라진 것들’로 돌아왔다. 2019년 한국에서 그의 데뷔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2008)이 역주행하면서 친숙해진 작가다. 기승전결로 나눌 수 없고 시작도 끝도 모호한 그의 단편소설에 속절없이 매료된 한국 독자들은 손꼽아 후속작을 기다렸다. 데뷔작 이후 내놓은 장편소설(어떤 날들·2013) 한 편을 제외하면 무려 15년의 기다림이었다.
소설집에 실린 15편의 단편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도 같은 삶 속 찰나의 순간을 그린다. 영원히 내 것이라고 여긴 것들부터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사소한 무언가에 이르기까지, 어김없이 흐르는 시간에 모든 것을 떠나보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이처럼 ‘평범한 삶의 복잡함’을 단정한 문장으로 묘사하는 데 탁월한 작가는 이번에도 자신의 주특기를 아낌없이 드러낸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인칭으로 쓰인 수록작 속 등장인물들은 10대 청소년이나 청년이었던 전작에 비해 나이가 들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마흔세 살이 되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다니”라는 ‘라인벡’ 속 화자처럼 중년이 된 이들은 삶과 상실을 회고한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는데도 그 순간엔 거의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 대학 시절의 친구들(‘오스틴’)이나 희소 질환으로 인한 첼로 연주자로서의 재능(‘첼로’), 아이가 태어난 후 피우지 못하게 된 담배(‘담배’) 등 사라진 것들은 저물어가는 젊음 그 자체로도 읽힌다.
작품의 주제를 먼저 정하기보다는 경험이나 기억,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이야기를 쓴다는 작가는 ‘사라진 것들’ 역시 몇 개의 수록작을 쓰다 보니 “모든 등장인물의 삶에서 사라진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전작을 집필할 당시 30대였으나 이제 50대로 접어든 그의 관심이 젊음의 절정을 지나온 사람의 회한으로 옮겨간 것은 자연스럽다. 등장인물과 작가뿐 아니라 후속작을 기다린 독자도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온 만큼 저마다의 사라진 것들을 품고 있을 테다.

사라진 것들·앤드루 포터 지음·민은영 옮김·문학동네 발행·332쪽·1만8,000원
다만 “가끔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생각에 매달려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라는 수록작 ‘히메나’의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냥 흔쾌하진 않을지 모른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청춘이 언젠가 끝난다는 주지의 사실에 수긍하는 건 고통을 수반한다. “문학이 줄 수 있는 자기 발견의 기쁨과 고통을 앤드루 포터만큼 잘 그려내는 작가도 드물 것”이라는 최은영 소설가의 말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데다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 15편의 수록작 속 인물들의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숨이 막힌다. 이는 좁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묘사의 방증이기도 하다.
상실과 고독을 다루면서도 허무주의로 치닫지 않는 건 수록작이 전부를 설명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서다. ‘실루엣’에서 화자는 친구가 자신의 대학 정년직 교수 후보 심사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여기고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그들과의 내키지 않는 저녁자리에서 이 분노가 엉뚱한 분풀이였을지도 모를 가능성을 마주하고 말없이 친구의 집을 떠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실루엣”이 구호나 기도문을 외는 듯이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라 외친다.
소설은 이대로 끝나고, 빈 공간이 남는다. 이 외침에 당신은 발걸음을 돌려 친구 부부와 함께 디저트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가. 미국의 작가 찰스 담브로시오는 “고전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결코 다 하지 않는 작품이라는 정의에 비춰보면 ‘사라진 것들’은 이미 고전”이라고 말했다.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오늘날의 고전, ‘사라진 것들’로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건 오롯이 읽는 당신의 몫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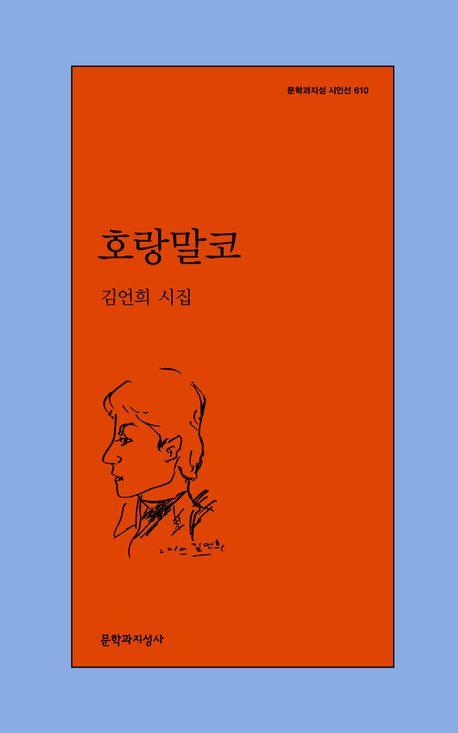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