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이지만 값진 경험 쌓은 日
미국은 有人, 인도는 저비용 탐사 도전
우주개발 목표 세우고 인재부터 모아야
편집자주
과학 연구나 과학계 이슈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과학의 눈으로 분석하는 칼럼 ‘사이언스 톡’이 3주에 한 번씩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 인근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사가미하라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니나카 히토시 JAXA 우주과학연구소장이 이날 달에 착륙한 탐사선 '슬림(SLIM)'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은 자국 달 착륙선 ‘슬림(SLIM)’에 60점을 줬다. 슬림 책임자인 구니나카 히토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작사) 우주과학연구소장이 착륙 직후 기자회견에서 슬림의 성과는 몇 점짜리냐는 질문에 “겨우 합격인 60점”이라고 답했다. 잘했다고 마냥 추켜세우기도, 못했다고 대놓고 나무라기도 애매하다.
연관기사
점수가 깎인 까닭은 기체가 경사진 면에 착륙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져 태양전지판이 태양 쪽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배터리로 버티던 슬림은 착륙 2시간 40분 만인 20일 오전 3시 전원이 꺼지고 말았다. 들떴던 일본 현지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지만, 그래도 부럽다. 아무도 웃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라도, 박한 평가를 받았어도, 세계 다섯 번째 달 착륙을 시도하는 동안 일본 우주기술은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일본의 우주개발에선 ‘핀포인트’가 눈에 띈다. 내리기 쉬운 곳에 내린 다른 탐사선들과 달리 슬림은 정해둔 지점에 정확히 내리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했다. 달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기술이다. 5년 전 작사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에 착륙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광활한 우주에서 작디작은 소행성을 콕 집어 오차를 최소화하며 닿는다는 건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서 앞선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슬림이 달에 가기 열흘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올해 11월로 예정됐던 유인 달 궤도선 추진을 내년 9월로, 내년이었던 우주비행사 달 착륙 계획을 2026년 9월로 각각 미룬다고 발표했다. ‘아르테미스’라고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뚜렷하다. 반세기 만에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길을 찾기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 손을 잡고 타국 참여에도 문을 열었다.
슬림보다 다섯 달 먼저 달에 갔던 인도 착륙선 ‘찬드라얀 3호’는 지난해 9월 영원히 잠들었다. 영하 100도 아래로 내려가는 밤 추위를 견디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인도의 우주개발 키워드는 저비용이다. 달의 밤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지만 인도는 찬드라얀에 복잡하고 무거운 보온장치를 달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비용을 되도록 줄이면서 착륙선을 생존시키는 기술에 도전한 것이다.
아직 문도 안 연 우리나라 우주항공청(KASA)에는 이미 2032년 달에 착륙하라는 시간표가 주어졌다. 맨땅에서 착륙선 개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착륙선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과학기술인의 합의를 통해 도출한 달 탐사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다. 남들이 다 달에 가니까 우리도 가겠다는 것보다 구체적인 답을 우주항공청이 제시해야 한다.
달 착륙도 우주항공청 출범도 성공의 관건은 인력 확보다. 우주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데 300명에 달하는 우주항공청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그간 우주개발을 주도해온 인력풀도 작은데 그마저 기술 분야나 출신 대학별로 갈라져 있고,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다른 분야 과학자들에겐 우주항공청이 관심 밖이라는 학계 일각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각축장이 되고 있는 달에서 세계 10번째, 20번째 착륙 성공 정도로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달에 왜 가는지, 어떻게 갈 건지 큰 그림부터 차분히 그려봐야 할 때다. 60점은 결코, 쉬운 점수가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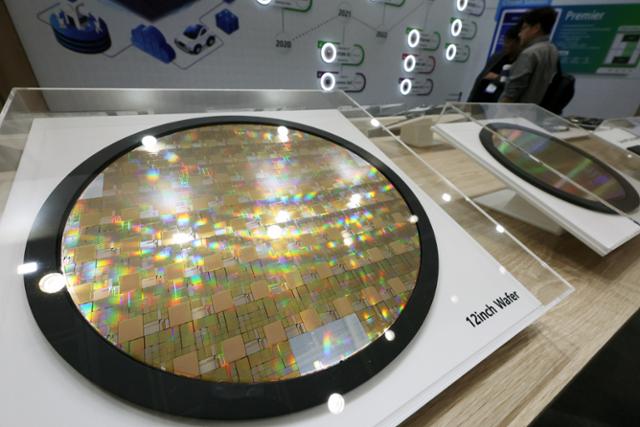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