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의대증원 관련 입장이 담긴 손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사 위기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다.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아무리 심각하다지만, 환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어놓은 채 의사들의 오랜 숙원만 해결해주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연내 추진이다. 법은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걸 전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이 책임∙종합보험을 두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지만, 두 법안의 결정적 차이는 외면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고의성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의료사고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에서 환자가 직접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더구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와 중상해를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데, 의료사고는 중상해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의료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차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미용∙성형 분야 제외 여부를 향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두었는데, 뒤집어 말하면 필수의료만이 아니라 이들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에 처벌 면제를 해주겠다는 뜻일 것이다. 필수의료대책이 아니라 의사민원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과실치사상죄에 해당돼도 처벌을 감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2중, 3중을 넘어 4중, 5중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대 증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의료계를 달랠 카드가 필요할 수는 있다. 과도한 의료사고 분쟁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협상 카드가 돼서는 곤란하다.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필수의료의 성격상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법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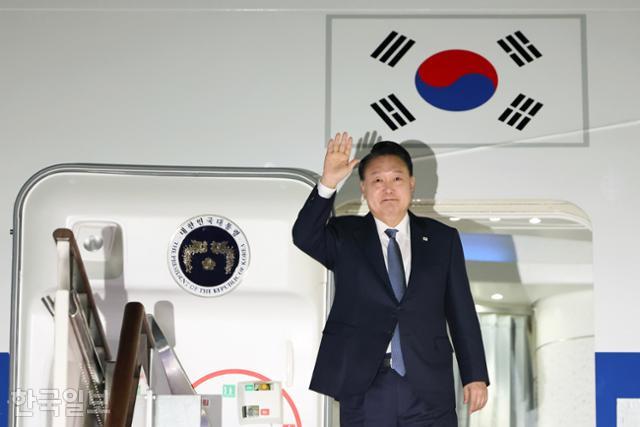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