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녘에는 봄이 왔지만,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 기와집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처마 아래에는 고드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따스한 햇살이 지붕에 내려앉자,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떨어지면 경쾌한 소리를 들려준다. 고성=왕태석 선임기자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은 아직도 겨울 풍경에 갇혀 있다. 마을 곳곳에 줄지어 늘어선 기와집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처마 아래 줄줄이 매달린 고드름은 햇빛에 반짝거려 눈이 부셨다. 오후 들어 포근한 햇살이 지붕에 내려앉자 겨우내 꽁꽁 얼었던 고드름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똑…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자연이 연주하는 ‘봄의 찬가’처럼 경쾌하고 아름다웠다.

남녘에는 봄이 왔지만,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 기와집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처마 아래에는 고드름이 남아 있다.
마을을 거닐며 여기저기 둘러보다 유독 쓸쓸한 분위기가 풍기는 기와집에 눈길이 쏠렸다. 유난히 고드름이 많이 달린 그 집은 밧줄로 대문을 막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텅 빈 마당엔 찬바람만 불어 을씨년스러웠다. 따스한 사람의 온기는 한 움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나가는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니 “이 집은 최근 주인이 세상을 떠나 빈집이 되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빈집이라 난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른 집보다 고드름이 더 많이 맺힌 것이었다.

남녘에는 봄이 왔지만,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 기와집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 처마 아래에는 고드름이 남아 있다.
주인 없는 집을 나서자 문득 고향집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역설적이게도 눈앞에 펼쳐진 고드름의 향연은 ‘지방 소멸’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곧 봄이 이 마을에도 찾아오겠지만 적막함은 깊어질 것이다. 갑자기 ‘똑… 똑…’ 떨어지는 고드름 녹는 소리가 ‘봄의 애상곡’처럼 들려왔다.

포근한 햇살이 지붕에 내려앉자 겨우내 꽁꽁 얼었던 고드름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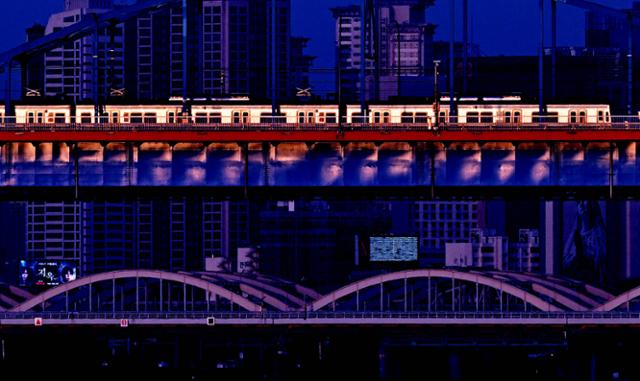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