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400원을 넘긴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원·달러 환율이 서울외환시장에서 16일 한때 1,400원 선에 올라섰다. 지난주 미국의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산되며 1,360원 선이 무너졌고, 여기에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 하반기 정도다.
환율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394.5원에 마감됐다. 하지만 이번 환율 급등은 대외 악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내수경기 악화가 중첩된 상황이라 한동안 1,400원 대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환율 상승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이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대외 순자산국이므로 환율 상승은 대외 채무 위기를 부르기보다는 대외 자산 증가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한 데다 이달 들어 국제유가까지 뛰면서 조만간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다. 장기 불황에 빠져 있는 내수 산업에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늘어난 국내 기업의 외화 빚도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비금융기업의 대외채무는 225조 원(1,626억 달러)에 달한다. 다행히 장기 부채 비중이 커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외화 빚이 많은 기업의 수지 악화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올해 ‘상저하고’ 경제정책 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원홧값 하락과 유가 강세가 계속되면, 민간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가 환율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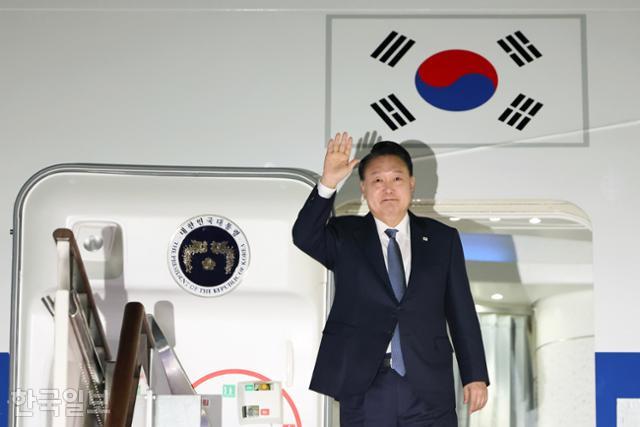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