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세종=이유지 기자
"검사잖아."
자카르타 특파원 귀임을 앞둔 2022년 2월 한 주재관이 눌러 말한 한마디. 그 부연을 대선 전인 당시엔 웃어넘겼다. 거친 표현을 걷어 내고 요약하면 이렇다. "부처마다 업무 스타일과 분야, 성격이 다른데 검사 DNA로만 접근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다. 공무원은 힘들고 공직 사회 불만은 쌓일 것이다."
4·10 총선 결과는 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앙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공무원 도시' 세종은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야당을 택했다. 세종은 원래 '야성의 도시'라고 반박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놀랍다. 행정부 수장을 향한 행정부 밑바닥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 유권자의 5% 남짓으로 추산되는 공무원 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해석은 과할 수 있지만 그 상징성마저 무뎌지는 건 아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주로 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14개 동 전체에서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공직 사회의 불만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민생'이 증폭시켰다. 총선 전까지 석 달간 24번 진행한 민생 토론회가 정점이다. 기존 부처 업무보고를 현장 준비와 섭외까지 하달해 대통령 행사로 포장한 건 그렇다 치자. 각 부처, 특히 경제 부처는 대통령이 던진 정책을 말 그대로 수습하느라 바빴다. 금융투자소득세, 연구개발(R&D) 예산, 국가장학금 등이 그렇다. 전문가조차 손사래 치는 철도 지하화, 누가 봐도 부자 감세, 집값 양극화를 자극하는 토건 정책도 도마에 오른다.
정책 일관성, 타당성,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3무(無) 토론회라는 평가가 괜히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밀당도 아니고 그냥 끌려다니는 꼴", "용산에서 쏟아내는, 이거 예산 어쩔 거야, 우겨 넣어야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용산'재정부"라는 경제 부처 공무원의 푸념과 자포, 자조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커졌다. 이런 분위기를 몰랐다면 큰일이고, 알고 넘겼다면 더 큰일이다.
경제는 일관된 원칙과 수긍할 만한 비전이 안정된 시스템에서 어우러져야 돌아간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그렇다. 그 토대는 합리성과 설득력에 있다. 독단과 불통, 상명하복의 국정 운영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제 분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거부, 무차별적인 전 정권 뒤지기 등을 공무원 민심 이탈 배경으로 꼽는 공무원도 있다. '수장은 무책임, 직원은 무한 책임' 구도는 불신의 싹이자 복지부동의 양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권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다.
세종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 공무원 표심은 더 심란해진 것으로 보인다. 총선 뒤 생중계된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두고 관가에서 뒷말이 나온다. 사전 버전과 현장 버전이 묘하게 달라 "왜 남 얘기냐"고 부글부글했다는데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안 바뀌겠구나.' 예컨대 이렇다.
사전 버전: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현장 버전: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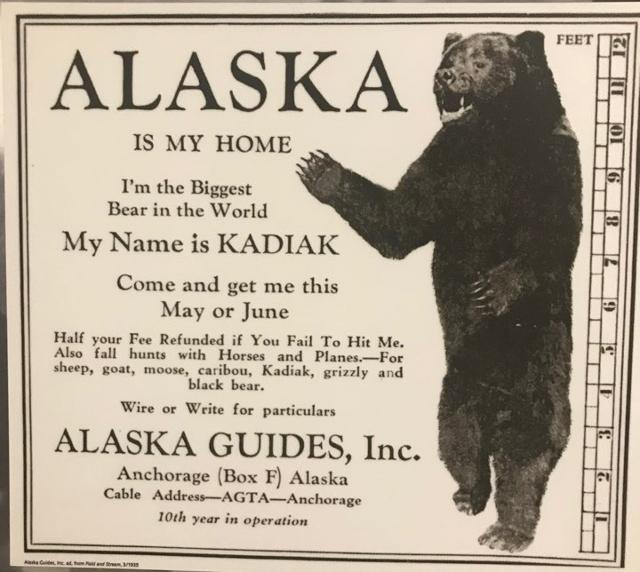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