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최정균 카이스트 교수 '유전자 지배 사회'
유전자에 새겨진 자연적 차이가 생존에 도움
그 차이를 차별이 아닌 공존으로 만들어야

'유전자 지배 사회'를 낸 최정균 카이스트대 교수. '도킨스 리부트'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동아시아출판사 제공
"더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 그러자 내가 미워졌다." 너무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 브레히트가 쓴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한 구절이다. 이 시는 왜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저리게 했을까. '유전자 지배 사회'를 낸 카이스트 최정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자연에선 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더 강한 것일 뿐이다. 그 자연적 현상을 두고 스스로 미워할 줄 안다는 건, 인간의 문명적 도약이자 결단이다."
저자가 서문에서 침팬지 연구자 제인 구달,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같은, 언뜻 결이 달라뵈는 이들을 한데 묶어두고는 "자연의 본성에 대해 너무나 낭만적 환상을 가졌던 학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해둔 이유다. 자연은 거칠고 메마른 죽음의 공간일 뿐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전자 지배 사회'는 전투적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스의 복권, 그러니까 '리부팅 도킨스'다. 그래서 저자가 제일 먼저 꺼내는 것도 '포괄 적합도', 즉 '해밀턴 법칙'이다.
외할머니의 사랑 뒤에 숨은 유전학적 진실
해밀턴 법칙이란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최우선에 두는 이기적 존재이기에 이타적 행위라 해도 유전자 공유 정도에 따라 차별하리라는 걸 '근친도'로 나타낸 것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1이라면, 같은 부모 아래 형제는 0.5, 사촌은 0.125의 근친도를 가진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너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경우란 형제라면 최소 2명 이상일 때, 사촌이라면 최소 8명 이상일 때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선행을 할 때조차 자신과 상대의 피가 얼마나 섞였는지 순식간에 알아내 그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이다.

2018년 첫 방한 강연을 하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 인터파크 제공
인간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유전자에 놀아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탄식이 끊이지 않자, 도킨스 스스로는 '이기적 유전자' 40주년 기념판을 2016년 내놓으면서 "나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32촌의 2대 후손"이라거나 "우리는 누군가와 어떻게든 친척이 된다"고 했다. 이론 전개상 너와 내가 겹치는 핏물 농도가 몇 퍼센트냐 계산했을 뿐, 이래저래 따져 보면 우리 영국인은, 유럽인은, 세계인은 일가친척이나 다름없다는 해명 아닌 해명이다.
하지만 저자는 유전자 공유 정도에 따라 호혜의 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각종 실험결과들을 들이민다. 빽빽한 숲에서 나무들은 자신의 일족이라 인정되는 나무를 위해서만 뿌리와 가지가 뻗어나갈 공간을 내준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손주에게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는 외할머니다. 제 배불러 새끼를 낳기에 자기 새끼 여부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게 암컷이다. 외할머니에게 내 딸의 자식인 손주는 유전적으로 가장 확실한 후손이다. 그러니 가장 아낌없이 투자한다. '포근한 외가댁 사랑' 뒤에 숨은 유전학적 진실이다.
보수vs진보, 인종, 젠더 ...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도킨스가 40년 동안 주야장천 욕먹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 논리를 정치, 경제 등 전 사회분야로 확대한다.
예를 들자면 고정 관념, 차별, 혐오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생존을 위한 빠른 판단을 돕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다. 쓸데없이 이타적 대의를 지향하는 '진보' 성향은 후기구석기 이후 나타난 변이 유전자의 영향이다. 그렇기에 유전적으로 보면 '강남 좌파' 혹은 '문화계를 장악한 진보좌파' 또한 매우 '자연'스럽다. 생존 공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여유 있는 헛똑똑이들이 그쪽에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중 나선 구조로 알려진 DNA의 모습. 유전자의 영향력은 생각 외로 압도적이다. 동아시아 출판사 제공
민감한 주제도 건드린다. 인종은 사회적인 구분일 뿐 생물학적으론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언제까지 인종을 '구분'하는 순간 '차별'에 악용된 험한 과거에 과학 연구가 발목 잡혀야 하는가 반문한다. 젠더 또한 그렇다. 저자는 '생물학에 대한 페미니즘의 반감이 결국 독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인류학자 세라 블래퍼 하디의 주장을 소개해뒀다.
"생물학적 차이를 과장하지도, 지워버리지도 말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스피디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였다면 읽어나가는 재미는 쏠쏠하다. 종교와 과학은 대립한 적이 없으며 자연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일하다는 마지막 6장 '종교'는 이 책의 핵심이다.

유전자 지배 사회·최정균 지음·동아시아 발행·276쪽·1만7,500원
그래서 저자가 하고픈 말은 무엇일까. 결국은 인간 문명에 대한 긍정이다. 저자는 다윈의 진화론을 초창기부터 적극 옹호한 토머스 헉슬리의 말년 강의를 소개해뒀다. 헉슬리는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우주의 과정을 모방하거나 도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과정과 싸워가면서 얻어내는 것"이라 강조했다. 모방, 도피가 아닌 투쟁이다. 황폐한 죽음으로 치닫는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는 투쟁이 바로 유전자다.
저자는 이를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무는 자연을 고발하는 것이어야지 자연을 찬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다. 생물학은 자연적 차이를 들어 차별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학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 차이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지워버리는 학문도 아니다. 그보다 자연적 차이의 기원을 깊이 음미함으로써 공생으로 승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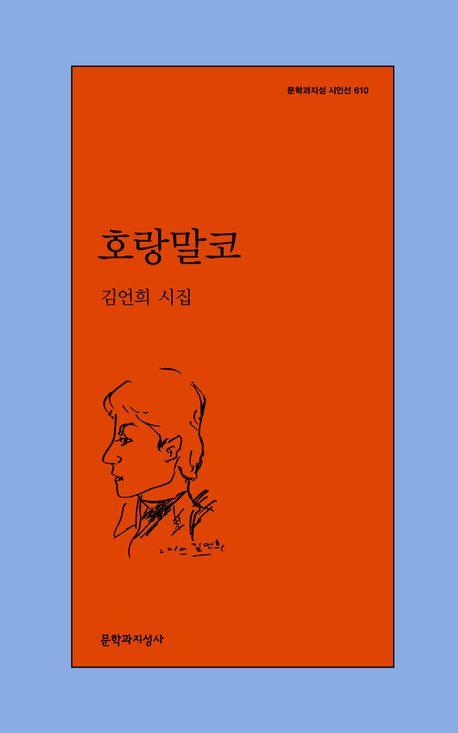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