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육재정 전용 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았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며 어제부터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교사 양성체계와 재원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은 손을 대지 못했다. 의대 증원처럼 의욕이 앞서 사회적 진통만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교육부가 어제 내놓은 로드맵을 보면 올 하반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하루 최대 12시간의 돌봄이 제공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에 나서고,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 유보통합은 2026년 시행된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가장 큰 난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및 처우 통합부터 결론을 미뤘다.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안과 영아(0~2세)와 유아(3~5세) 교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복수로 내놓았을 뿐이다. 임용 자격과 과정이 다를 뿐 아니라 큰 임금 격차 탓에 합의 도출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 문제도 간단치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를 넘겨받게 될 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국고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추가 예산이 6조~7조 원이 필요한데 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보육과 교육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반발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자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누리과정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과 돌봄 격차가 상당한 현재의 이원 구조는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이 옳아도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은 공론화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의정갈등에서 여실히 학습했다. 과거 정부에서 번번이 좌초된 전례 또한 거울 삼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진통을 최소화하며 난제를 풀어내는 것, 그게 진짜 정부의 능력이다. 껍데기뿐인 유보통합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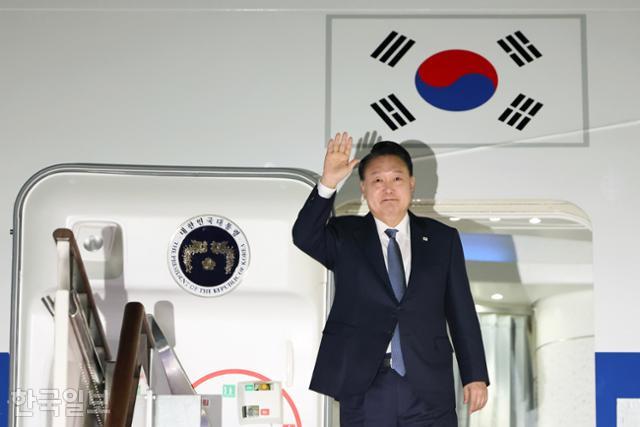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