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리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까지 인정한 영부인에 대한 조사 특혜도 문제지만, 일선 검찰청이 이를 보고하지 않고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치화가 기강과 건강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조직 자해’의 지경에 이른 게 아니고 무엇인가.
중앙지검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했고, 제3 장소 조사를 총장이 반대할 수 있어서 보고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한심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수사지휘 배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여서 총장 부인 수사를 엄격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이를 지금에 와서 영부인 특혜 제공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사지휘 배제가 문제라면 수사팀이든, 중앙지검장이든 법무부에 철회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다.
과거 검찰 내부의 갈등은 주로 정권의 압력을 전달한 수뇌부와 원칙을 지키려는 수사팀의 충돌로 빚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일선 수사팀에서 먼저 원칙을 저버리고 총장과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검찰 인사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좌지우지하면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한 검찰 조직 원리가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지난 5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수사지휘부가 교체될 때부터 예견됐다. 총장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고, 총장 지휘와 수사 원칙이 아닌 권력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검찰의 흉기화에 다름 아니다.
이 총장은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장의 임기로 볼 때,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나 수사지휘 배제를 장담할 순 없다. 무엇이 검찰조직을 살리는 길인지 수뇌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장 패싱’이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진다면 검찰 역사에 수치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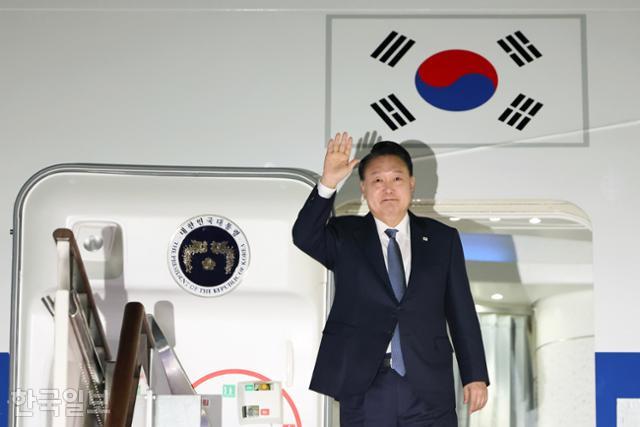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