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현장에 가 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뜻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의료 공백을 일부 집단의 가짜뉴스쯤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여기엔 어떤 경우에도 의대 증원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생명이 걸린 고통을 감내하라고 언제까지나 강요할 수는 없다. “저는 의료현장을 많이 갔다”는 윤 대통령의 확신에 찬 발언은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지는 현장 상황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응급환자가 병원 14곳을 돌다가 119구급차에서 사망하고, 만삭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속출한다. 이달 초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사고에서도 부상자가 16시간가량 응급실을 전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응급실 뺑뺑이’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이전에도 있었을 뿐 의정갈등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 의료진은 지쳐 쓰러지고 문을 닫는 응급실이 쏟아지는데 언제까지 이런 확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말 윤 대통령 귀에는 현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 큰 악재가 된 ‘대파 파동’을 기억할 것이다. 민생현장을 찾겠다며 할인 매장을 들러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 혹시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된 병원 응급실만 찾아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여당의 제안마저 단박에 거절할 만큼 퇴로조차 열어놓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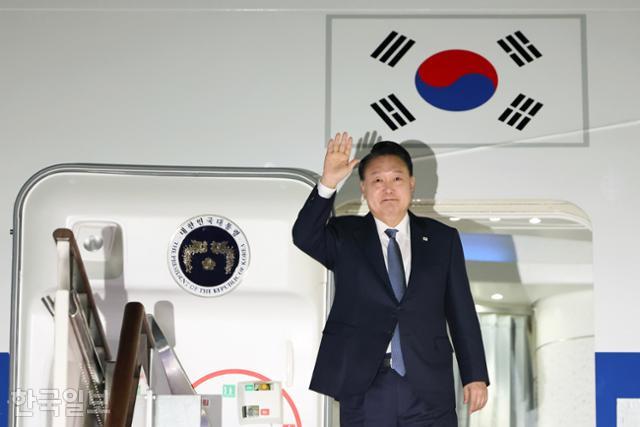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