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 사람, 가발 같지 않아?” 지하철에서 직장 동료로 보이는 이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적이 있다. 온갖 근거들을 들이댔다. 어떻게 스타일이 매일 똑같냐, 바람에 날리는 걸 본 적 없다 등등. “가발이면 뭐 어때서?”라고 속으로 발끈했지만, 스스로 당당할 것도 없었다. 여성 외모 품평에는 발끈하는 사람들조차 유명인의 가발 진위 품평에는 아무 거리낌없이 가세하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삭발 이벤트를 눈으로 직접 보고도 여전히 가발 운운하는 이들이 있겠나.
□가발이 처음부터 탈모를 숨기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가발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간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용도였지만, 상류층은 계급 과시용으로 인모(人毛)에 금장식이 얹어진 화려한 가발을 착용했다. 탈모용 가발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17, 18세기 무렵 프랑스다. 어려서부터 탈모가 심했던 루이 13세와 그의 장남 루이 14세는 왕실에 수십 명의 가발 장인까지 고용했을 정도다.
□통상 탈모 징후가 보이면 처음엔 탈모샴푸나 영양제 등을 찾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서 프로페시아 등의 약물을 처방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진료를 받은 이들이 110만 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각광을 받은 건 탈모인 스트레스의 방증이다. 가발은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건 물론 이를 희화화하는 주변 시선 영향도 크다. 가발 착용 사실을 당당히 주변에 밝히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조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 논란이 기승을 부렸다. 한 인플루언서가 그를 ‘가발거치대’라고 거칠게 조롱한 글이 급속히 퍼졌고, 여의도 탄핵 집회 곳곳에는 그의 가발을 희화화한 모형 팻말이 등장했다. 정치적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진위조차 확인 안 된 가발에 묻는 건 한 대표는 물론 모든 탈모인에 대한 무례다. 2022년 영국 고용심판원 판사는 상사가 대머리라고 놀려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탈모가 있는 남성을 '대머리'라 부르는 건 성희롱이다. 여성의 가슴 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과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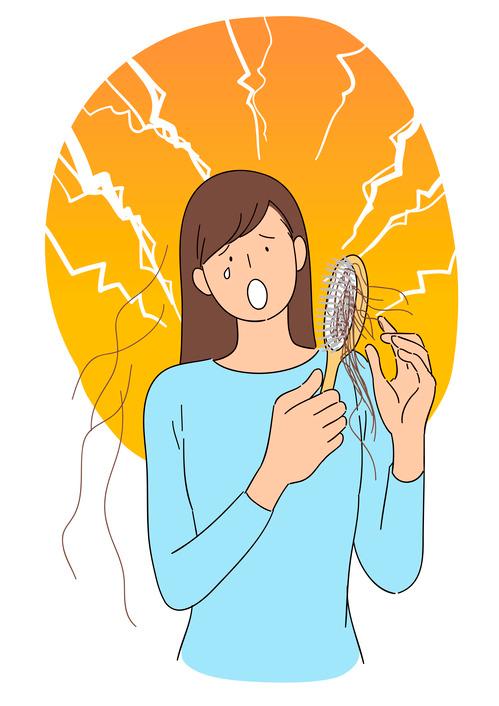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