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는 한국일보 중견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 등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 노지양씨를 만났을 때 들은 얘기다. 외서 80여권을 번역한 경험에 비추어 영어는 명사 동사가, 한국어는 부사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했고 대개 영어가 한국어보다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단다. 영어 한 단어를 한국어 두세 단어로 풀어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말 특징을 체감한다는 것이다. 놀란 건 그 다음 덧붙인 설명이다. 한국어의 빈곤한 어휘 중에서 유독 풍성한 표현을 자랑하는 분야가 있으니 불행과 가난에 관한 말이란다. ‘처참하다, 비참하다, 처절하다, 참혹하다, 궁하다, 빈약하다, 어렵다, 옹색하다, 쪼들리다, 가빈하다’로 이어지는 불행과 가난의 유의어 중 해당 문장에 딱 들어맞는 어휘를 찾을 때, 한국전쟁 즈음에 찍었을 땟국에 전 어린 아이 사진이 자꾸만 생각난다고 노씨는 말했다.
언어는 사회를 닮고, 시대는 언어로 규정된다. 둘 중 무엇이 먼저 영향을 끼치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말이 사회와 함께 변한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기사와 요즘 기사를 비교해보시라. 한자는 줄었고, 한층 구어에 가까워졌다.
‘“재생(再生)이란 것을 실감합니다.” 제32회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을 현기영씨는 자신의 문학적 재생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겸양한 그는 수상작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바로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본보 1999년 11월 17일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제가 됐죠?” 올해 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12일 전화로 알렸을 때, 최은영 작가의 첫마디는 그랬다. “수상 취소됐다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며칠 뒤 두 번째 통화에서도 그랬다. 겸손을 과장한 거였을까.’ (본보 2018년 11월 20일자)
언어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권역의 위상과 함께 가지만, 그 언어권에서 말과 글로 밥 먹고 사는 이들의 역량에도 비례한다. 셰익스피어와 괴테가 수많은 신조어와 새 표현을 만들며 영어와 독일어 위상을 바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옥같은 막말로 영어의 위상을 깎아먹고 있듯이. 작가는 말을 확장하고, 기자는 말의 경제성을 높인다. 정치인은 제도와 이상과 민중의 말을 잇는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다.”(4월 2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KBS기자가)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5월 1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15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정치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게워낸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일베 용어를 쓴다. 우리말의 ‘빈약하고 불완전한(소설가 김훈)’ 특징은 우리의 팍팍했던 삶에도 그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과 글로 밥 먹고 사는 이들이 제대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언어는 현실을 이해하는 준거 틀이다. 인식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언어의 특징, 수행성(performativity)은 현대 철학의 화두 중 하나다. 쏟아지는 막말에 ‘관심에 목마른 이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란 온정적 해설이 애써 뒤따르지만, 저 말들이 화자가 타인과 세상을 인식하는 수준이란 걸 온전히 부정하긴 어렵다.
현실 인식이 일반과 다르면 현실에 개입하고 실천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나 아베 신조의 막말이 나라말의 위상을 깎아먹는다는 우려로 그치지 않는 이유다. 부끄러움이 막말을 듣고 있는 국민의 몫이듯, 폐해도 국민의 몫이다.
이윤주 지역사회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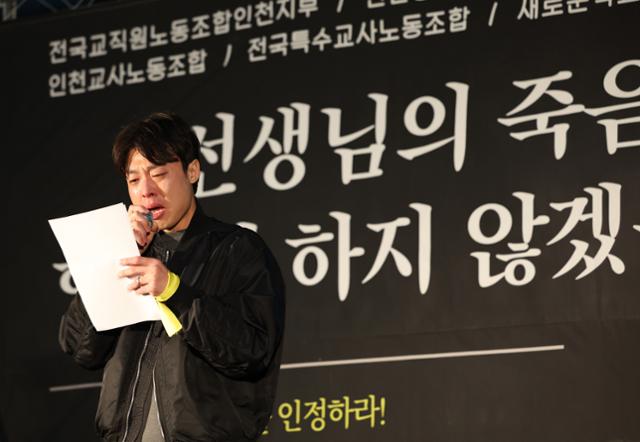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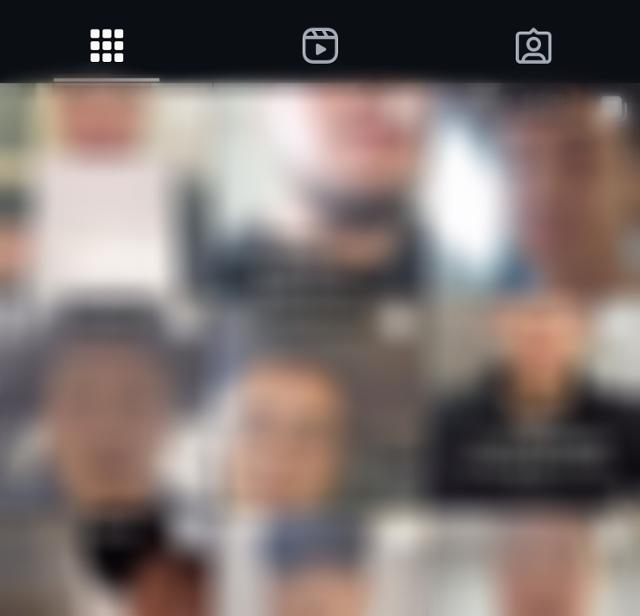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