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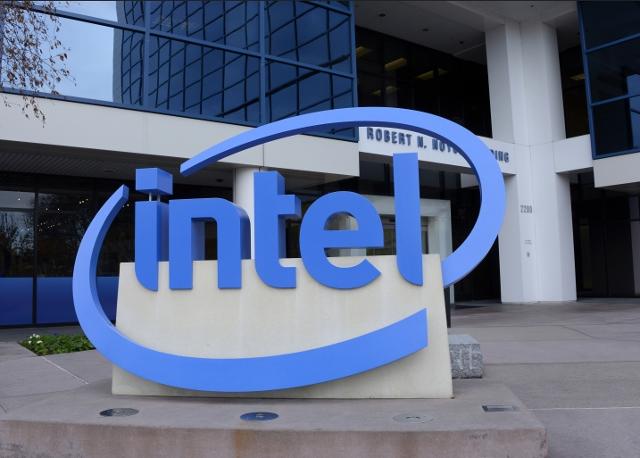
지난 반세기 동안 ‘반도체 제국’을 구축했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해 온 탓에 최근 날개 없는 추락만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티아주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인텔 본사. 연합뉴스
절대 권력으로 통했다. 사실상 독점 공급이었기에 시장에선 당연하게 정해진 룰처럼 여겼다. 컴퓨터(PC)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 칩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인텔의 전성기 시절이다. 지난 1971년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한 인텔은 이후 최근까지 반도체 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지구상의 대부분 전자제품에 내장됐고 인텔의 위상도 하늘로 치솟았다.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가 주창한 ‘무어의 법칙(반도체 성능은 1년 6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을 앞세우고 메모리반도체에서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서버 칩을 포함해 주요한 칩의 업계 표준조차 인텔에 의해 설계됐다.
그렇게 50년 동안 철옹성을 구축해 온 인텔이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흐름에 폐쇄적으로 대처한 탓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축소된 PC시장만 고수하면서 대세로 다가온 모바일 시장을 과소평가했다. PC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핵심 경쟁력은 ‘고성능’이었지만 모바일에선 ‘저전력’으로 판이하게 달랐다. 모바일 시장을 과소평가한 인텔은 PC용에 적합한 고성능화에만 집중했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한 우물만 팠다. 모바일 분야로 옮길 핵심 역량의 전환 타이밍을 놓치면서다.
결과는 참담했다. 당장 큰손들이 떠났다. 2019년 애플에 이어 지난해엔 마이크로소프트(MS)까지 인텔과 결별했다. 자존심도 구겨졌다. 지난해 말엔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로부터 핵심인 반도체 생산을 멈추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모욕적인 주문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력인 CPU 시장에서 인텔은 날개 없는 추락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패스마크소프트웨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현재, 데스크톱 PC용 CPU 시장점유율에서 인텔은 49.1%에 그치면서 50.9%를 가져간 AMD에 1위 자리도 내줬다. 3배 이상의 점유율 격차로 AMD를 여유 있게 따돌렸던 4년 전 인텔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뒤늦게 적신호를 감지한 인텔에선 선장까지 교체했다. 인텔은 지난 13일 밥 스완 최고경영자(CEO) 대신 팻 겔 싱어를 CEO로 재영입했다. 인텔측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CEO 교체는 문책성 인사란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겔 싱어 신임 CEO는 과거 인텔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던 반도체 기술 전문가란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구원투수까지 기용했지만 인텔의 앞길은 막막하다. CPU의 경우, 경쟁사인 미국 AMD가 대만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손잡고 이미 지난 2019년 7나노(1㎚=10억 분의 1m) 제품을 생산했지만 인텔에선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내부적으로 정한 인텔의 7나노 양산 시점이 2023년이지만 모를 일이다. 겔 싱어 신임 CEO는 취임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기술력 부족 인정과 함께 파운드리 도입을 천명했다. 칩 설계와 생산, 판매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 온 인텔이 현주소를 시인하면서 반쪽 기업으로 전락한 꼴이다. 무어의 법칙을 내세우고 기술력의 상징으로 각인됐던 과거 인텔에 비하면 굴욕적이다. 천하의 인텔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파생시킨 부메랑엔 속수무책인 셈이다. 인텔 반세기에서 확인된 교훈은 분명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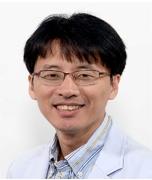
허재경 산업1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