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몰을 즐기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53%(497만 명)에 대해 두 차례 백신 투여를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했다. 텔아비브=AP 뉴시스
“9월까지 국민 70%(3,600만 명)가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이루겠습니다.” 정부가 요즘 슬로건처럼 되뇌는 말이다. 코로나19가 현재 수준으로 통제되면 국민 3분의 1만 접종해도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다.
그런데 얼마 전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이 “백신을 본격적으로 접종해도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토착화돼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백신 강국인 미국에서도 “완전한 집단면역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제 불능이 아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백신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백신(부스터 샷)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방역당국도 “집단면역에 도달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 퇴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집단면역 달성=코로나19 퇴치’로 알고 있었던 국민으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집단면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감염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 원리는 ‘기초감염재생산수(basic reproductive ratioㆍRo)’와 관련이 깊다. Ro(사전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1명이 몇 명의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내는지 나타내는 값)가 3이라면 환자 1명이 3명을 새로 감염시킨다는 뜻이다. 만일 3명의 감염 후보자 중 2명이 이미 항체 면역을 갖췄다면 면역이 없는 1명만 감염된다. 그리고 감염시킨 사람은 회복된다. 그러면 감염 환자는 1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전체 인구 집단으로 확장한 개념이 바로 집단면역이다.
Ro가 3일 때 매일 1,0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중 3분의 2(67% 내외)가 면역을 가졌다면 확진자는 1,000명으로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집단면역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지 급격히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전염성이 훨씬 강한 바이러스 변이가 퍼지면 Ro가 4를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에 도달하려면 국민의 75% 이상에서 면역을 가져야 한다. 90% 효과(efficacy)가 있는 백신을 국민의 85% 이상이 접종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다. 전 인구의 12.9%(668만 명)를 차지하는 영·유아~청소년을 위한 백신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 집단면역 달성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2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국민의 8%만 1차 접종을 마쳤을 뿐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등에서 나타난 혈전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국민이 61%에 불과한 실정이다.
집단면역을 오롯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스라엘ㆍ미국ㆍ영국처럼 일상생활을 회복하려면 집단면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정부는 더 안전한 백신 확보 등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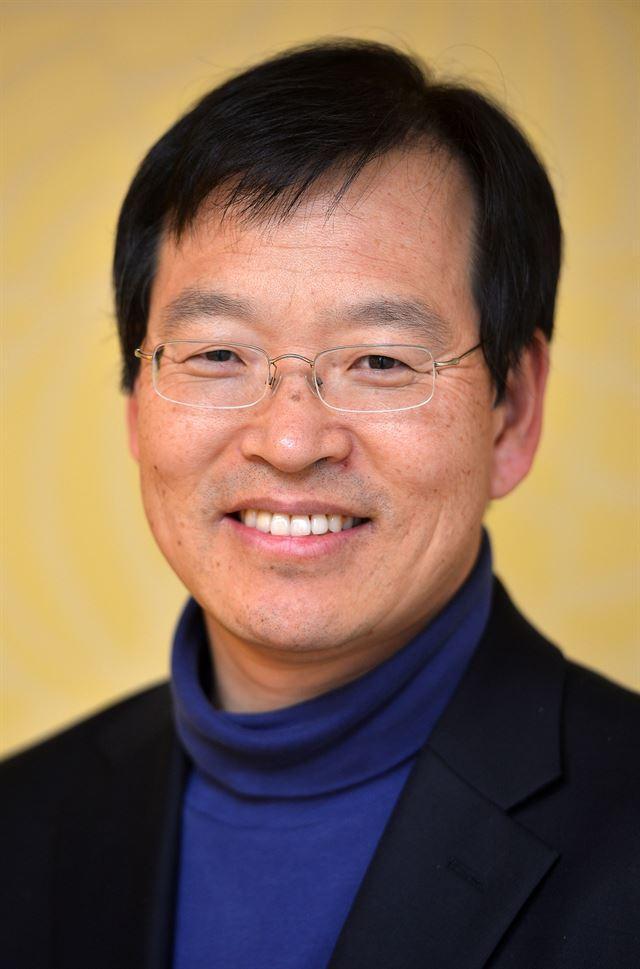
권대익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