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철호씨와 장덕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인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면서도 협정 내용과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협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국제법 위반에다 외교 갈등으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2012년 이미 배상 필요성을 인정했고, 최종으로 2018년 재상고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한 것과 배치된다. 이후 소송이 잇따르면서 내려진 여러 재판부의 판단과도 다르다. 최근 수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와, 배상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의 갈등을 생각하더라도 당혹스럽고 유감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제기된 여러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한결같았던 건 물론 아니다. 재판 관할권, 소멸시효, 일본 기업의 법인 동일성,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 등 여러 문제로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더 많았다. 하지만 비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심일 뿐 아니라 개인의 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인권 존중의 국제법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은 이 사안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위안부 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번 결정은 원고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겠지만 법적 시비 못지않게 외교적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 정부가 외교적 대화로 해법을 찾지 않고선 이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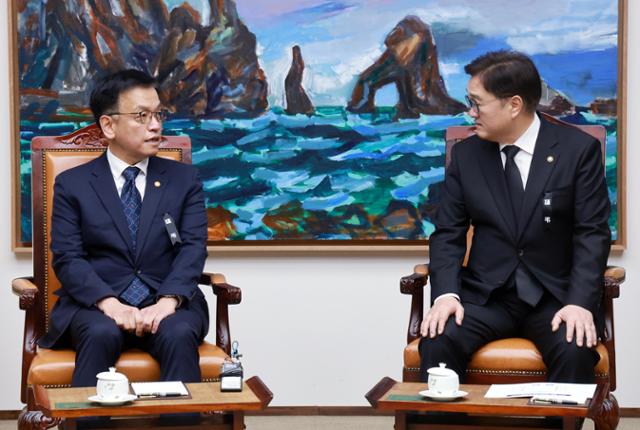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