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은 본능적인 것'이라 말하는 신간 '편향의 종말'
"편향은 옷감에 섞어 짠 은실처럼 문화 속에 있다"

편향의 종말·제시카 노델 지음·김병화 옮김·웅진지식하우스발행·500쪽·2만2,800원
혐오가 만연한 시대다. 그런데도 스스로 혐오주의자라 말하는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왜일까? 단순히 내 잘못에는 관대해서? 미국 저널리스트 제시카 노델의 신간 '편향의 종말'을 읽어 보면, 혐오나 편견을 자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대다수가 스스로 공정하게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향 사고'로 기울어 혐오와 편견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책에 따르면, 편향의 실체는 이렇다. 뇌는 범주화, 본질화, 고정관념 형성의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선 보상작용이 따른다. 불확실한 결과를 정확히 예견하면 쾌감을 느낀다. 반대로 고정관념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위협을 느낀다. 한 실험에서 백인 대학생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라틴계 학생들과 교류할 때 비호감을 느꼈다. 라틴계가 가난할 것이란 고정관념과 달라서였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뇌가 중독돼 편향 사고로 이어진다.
암묵적 편향은 더 위험하다.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편향적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등주의를 믿으면서도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의 해결은 더욱 어렵다.
하나의 회로처럼 작동하는 암묵적 편향은 문화적 지식을 흡수할 때 시작된다. 예컨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수학 실력이 우수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등을 통해 전해진다. 이 문화적 지식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발언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로 차별적 행동이 나타나며 다시 문화적 지식에 '먹이'를 준다. 악의 없이 시작된 암묵적 편향은 사회 곳곳의 차별로 번진다.

일러스트=신동준 기자
책은 “편견을 없애자”는 식의 공허한 조언은 하지 않는다. 대신 편향을 끊을 설계를 제안한다. 스웨덴 유치원에서 이뤄진 교육을 보자. 교사들은 의도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나누지 않았다. 이야기 속 등장 인물들의 성별을 뒤집거나 'hen'(스웨덴어로 성별 중립적 대명사)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성별에 따라 갖고 노는 장난감 종류를 예단하는 확률이 낮았고, 다른 성별의 낯선 친구와도 잘 어울리려 했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의 범주가 달라진 것이다.
‘나 역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을 해 본 사람이라면 해법을 담은 지침서로 쓸 만하다. 여전히 ‘난 차별한 적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저자의 말을 곱씹어보자. “편향은 옷감에 섞어 짠 은실처럼 문화 속에 짜 넣어져 있다. 어떤 빛 아래에서는 환하게 보이지만 다른 빛 아래에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인종주의적 발언만 캐치하는 백인과 달리 유색인은 버스에서 자신을 슬쩍 피하는 상대의 미묘한 행동까지 간파하는 것처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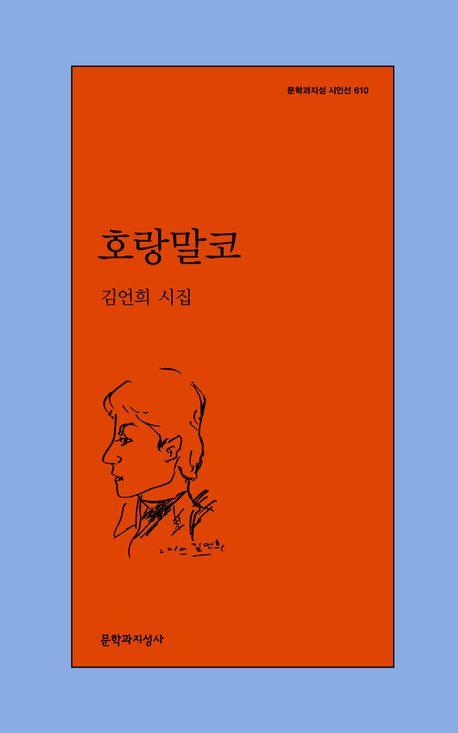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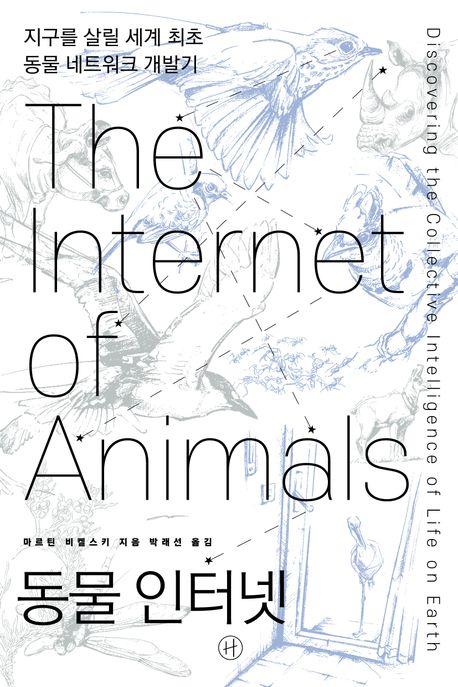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