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과 열매에 단맛이 완전히 스밀 때까지 우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태양이 필요한 시기니까. 게티이미지뱅크
가을은 사람을 감성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저절로 눈길이 가는 화려한 색의 열매들 때문일까.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든다.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다가 커다란 소쿠리에 널린 붉은 고추를 보았다. 햇빛 때문인지 반짝반짝 빛났다. ‘아니 벌써….’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니 대추나무도 감나무도 흐벅진 초록 열매들을 매달고 있다. 기나긴 더위 끝에 만난 가을이라 무척 반갑다.
장석주님의 시 ‘대추 한 알’이 떠올랐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천둥 몇 개, 벼락 몇 개/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무르익은 가을을 노래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도 웅얼거렸다. “이틀만 더 남국의 나날을 주시어/그 열매들이 익도록 서둘러 재촉해 주시며/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가을은 거친 몸짓으로 대추를 붉게 물들이고, 따뜻한 입김으로 포도알에 달콤함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맘때 우레 비가 잦아 걱정이다. “우르르 쾅쾅! 쏴아~” 하늘이 울면서 비가 무섭게 내릴 때가 있다. 그게 우레 비다. 안개처럼 뿌옇게 내리는 는개, 가늘게 뿌리는 실비, 먼지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 내리는 먼지잼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사납다. 그런 까닭에 수확을 앞둔 농부들에겐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과일의 당도를 떨어뜨리고, 탱글탱글 차지게 여물고 있는 벼 알곡의 숨통도 조일 테니까.
우레는 천둥의 우리말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에서 북을 치는 것 같다고 해서 천둥을 천고(天敲)라고도 표현했다. ‘우레라고? 우뢰가 바른 말 아닌가?’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대는 이가 많겠다. 우레의 이전 표준어가 우뢰이니 그럴 만도 하다. 우레는 우레→우뢰→우레 순으로 표준어가 바뀌었다.
우레는 ‘울다’의 어간 ‘울-’에 명사를 만드는 접사 ‘-게’가 붙은 형태다. 발음상 ‘울게’가 ‘울에’로 변했고, 울에를 연철한 ‘우레’가 표준어에 올랐다. 그런데 조선어학회가 펴낸 ‘조선어표준말모음’에서는 ‘우뢰’가 표준어 대접을 받았다. 우레를 한자 ‘비 우(雨)’와 ‘번개 뢰(雷)’가 더해진 ‘우뢰’로 오해한 탓이다. ‘우뢰’의 표준어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우레가 15~16세기 ‘소리치다’ ‘울부짖다‘는 뜻의 우리말 ‘우르다’에서 생겨났다는 학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우뢰가 아닌 우레가 표준어로 정해졌다.
북한에서는 ‘우뢰’를 문화어(우리의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우레 치는 것을 ‘우뢰질하다’, 많은 사람들이 치는 큰 소리의 박수는 ‘우뢰 같은 박수 소리’라고 표현한다. 남북 간 언어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인 셈이다.
기후 관련해 잘못 쓰이는 말로 ‘악천우’도 빼놓을 수가 없다. 악천후를 ‘비 우(雨)’가 들어간 ‘악천우’로 알고 쓰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악천후는 비뿐만이 아니라 눈이 올 수도, 우박이 쏟아질 수도, 바람이 매섭게 불어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몹시 요란하고 나쁜 날씨를 표현한 말이다. 나쁘다는 뜻의 ‘악(惡)’에 날씨를 의미하는 ‘천후(天候)’가 더해졌다. 쉬운 우리말 ‘거친 날씨’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가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새벽엔 안개로, 한낮엔 강렬한 태양과 매서운 비로, 저녁엔 빛나는 무지개로. 어떤 날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꿔 당황스럽다. 그래도 안개·번개·무지개, 하늘에 사는 세 가지 개를 다 보는 건 퍽 낭만적이다. 다만 포도가 달게 익고, 대추의 볼이 발그레할 때까지 우레 비는 참아줬으면 좋겠다. 수확의 보람으로 농부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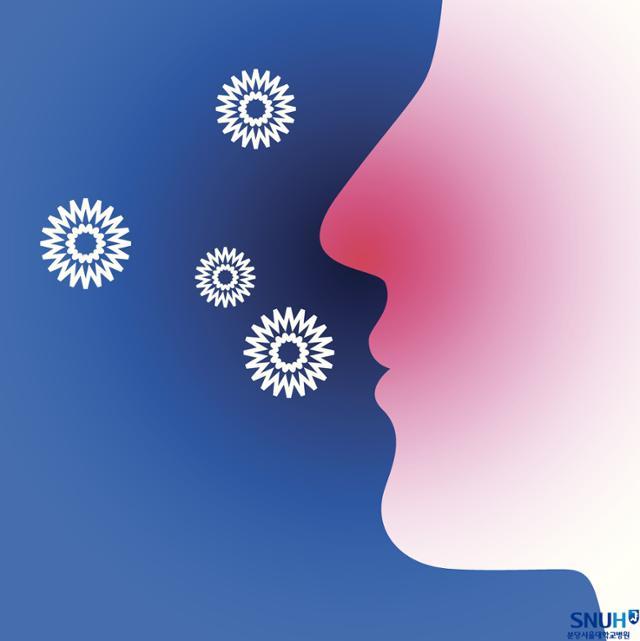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