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아는 동물의 죽음'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해 전 어미 잃은 새끼 길고양이 남매를 한꺼번에 둘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그 결정은 지독한 상실의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것이었다. 여전히 이들의 '죽음' 같은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후의 순간이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라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도무지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살 맞대고 교감했던 존재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언젠가는 도래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마음 구석으로 미루고야 만다.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겨우 10년 정도 되는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머지않을 미래의 상처를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동을 인간은 반복한다. 인간은 왜 기꺼이 동물과 만나고 또 이별하는가. 신간 '아는 동물의 죽음'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어린 시절, 물고기를 시작으로 여러 동물과 만나고 이별하며, 현재는 강아지, 붉은발거북 한 쌍, 비둘기들, 물고기 10여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논픽션 작가 E. B. 바텔스는 수많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이별의 역사를 되짚고, 더 나아가 다양한 애도의 방식을 소개한다.
가족 같은 존재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싶지 않은 반려인들의 잠재 수요가 커져서일까. 최근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업이 유망하게 부상하고 있으나, 기실 이는 기원전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도 행해지던 의식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반려 고양이가 죽으면 추모의 의미로 온 가족이 눈썹을 밀었으며, 죽은 뒤에도 영혼에게는 몸이라는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물을 미라로 만들어 종종 보호자와 같은 석관에 묻히기도 했다.
자기 고양이에 집착했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1862년 키우던 고양이 밥이 죽자 고양이의 발 가운데 하나를 보존 처리해 편지 봉투를 자르는 칼로 만들었다. 2012년 네덜란드 예술가 바트 얀센은 자신의 죽은 고양이 오빌(유명한 비행사 오빌 라이트의 이름에서 따왔다.)의 사체를 박제해 드론으로 만들었다. 일견 잔혹하고 인간 중심적인 행위 같으나,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애도'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책은 죽은 동물 친구들을 기리고 애도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이런 번거롭고 괴로운 마음까지 감당하며 동물과 함께 살아야겠느냐고. 하지만 언어가 통할 리 만무한 다른 개체와 오로지 눈빛만으로 서로를 교감하고 위로받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순진무구하게 우리에게 의존하며 우정과 사랑을 충만하게 퍼붓는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례한 충고와 침범이 난무하는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동물을 반려하는 일이 수반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랑하고 잃는 것이 아예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시인 앨프리드 테니슨의 말처럼.

자신의 반려 거북 테런스와 함께 사진을 찍은 저자 E.B. 바텔스. 위즈덤하우스 제공

아는 동물의 죽음·E.B. 바텔스 지음·김아림 옮김·위즈덤하우스 발행·296쪽·1만8,000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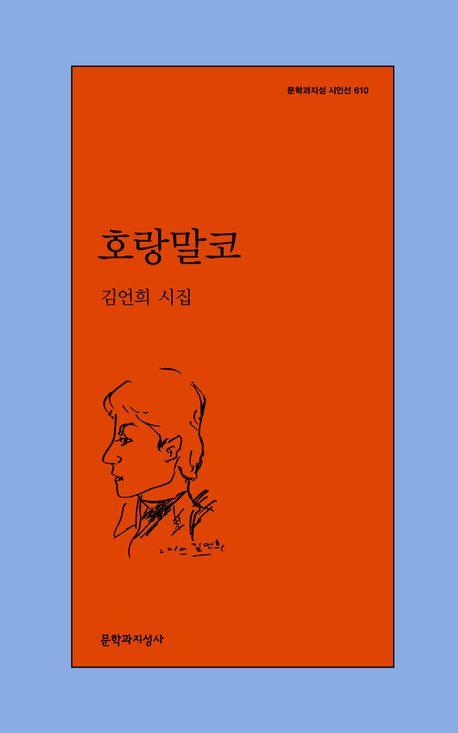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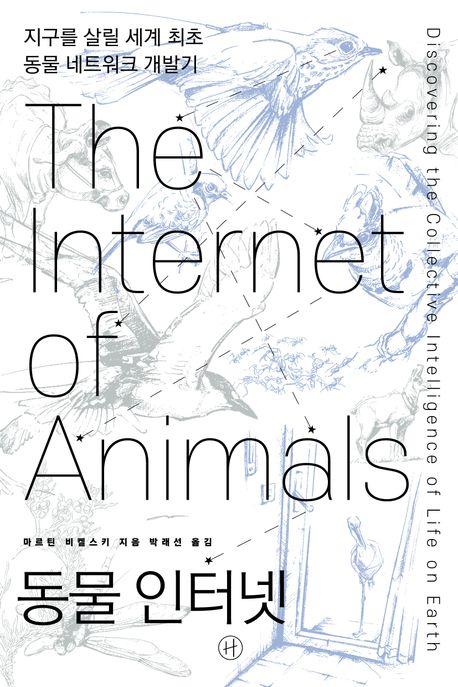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