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은한 햅쌀 향과 솔 향을 머금은 송편. 게티이미지뱅크
해마다 이맘때면 동네에 은은한 햅쌀 향이 퍼진다. 한가위를 앞두고 떡집에서 흐르는 향이다. 시장 떡집들은 경쟁하듯 맛있는 향을 뿜어댄다. 떡집 주인 내외가 비닐을 깐 큼지막한 좌판에 갓 쪄낸 송편을 쏟고, 즉석에서 참기름을 바른다. 그 고소한 향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잠시 서성거리니 맛 좀 보라며 두세 알을 손에 쥐어준다. 전통시장은 인심만큼이나 손도 크다.
식구가 많은 집안은 오늘 저녁 둥근 밥상 펴놓고 송편을 빚겠다. 소쿠리 가득 전도 부칠 게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이들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이게 우리네 명절이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 빚을 때/ 그 속 푸른 풋콩 말아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어 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가지도 휘이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어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서정주(1915~2000) 시인의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이다. 달도 둥글고 상도 둥글고 깔깔거리며 웃음 짓던 식구들의 입도 둥글다. 마음도 함께 둥글둥글해진다. 이 시를 읽으면 어린 시절 추석 전날 기억이 떠오른다. 송편 찔 때 넣을 솔잎을 따러 가던 아버지는 참 젊었다. 아버지 목말을 타고 산을 내려오며 봤던 그날의 풍경도 눈에 선하다.
우리를 기다리며 전을 부치던 엄마는, 아버지와 내가 돌아오면 솔잎을 깨끗이 씻은 뒤 시루에 송편을 쪘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면 마당 가득 솔향기가 퍼졌다. 솔잎이 찍힌 갓 쪄낸 송편을 입에 넣으면 가을을 먹는 느낌이었다. 한가위에 햅쌀로 만든 송편은 ‘오려송편’이라 한다.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오려'는 올벼의 옛말이다.
보름달의 명절인 추석에는 햇곡식, 햇과일 등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해-’와 ‘햇-’은 ‘그해에 난’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다. 햇김 햇감자 햇사과 햇밤 등 예사소리 명사 앞에는 ‘햇’이 붙고, 해쑥 해콩 해팥 등 된소리나 거센소리 명사 앞에서는 ‘해’가 된다. 그런데 햅쌀은 특이하다. ‘해쌀’도, ‘햇살’도 아니다. 중세국어의 ‘쌀’엔 첫머리에 ‘ㅂ’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절 잘 쇠고 술 한잔합시다.” “한가위 잘 쇠세요.” 한가위를 앞두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들한테서도 문자 메시지가 오니 반갑다. ‘쇠다’는 생일이나 명절 등 해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날을 지낸다는 뜻의 우리말이다. 그러니 한가위나 설뿐만 아니라 환갑, 대보름 같은 날에도 쓸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한가위 잘 쇠십시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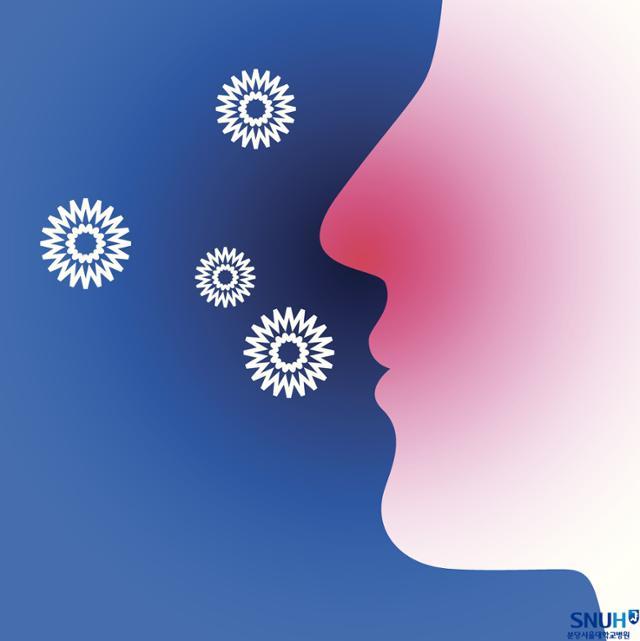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