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중구 남산터널 앞에 걸린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 팽팽하게 걸어 또렷이 보이는 앳된 얼굴과, 그날의 사연을 담은 굵은 고딕체 글씨가 보는 이를 더욱 아프게 한다. 노경아 기자
오늘도 소녀를 만났다. 아니, 소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봤다. 여느 때처럼 소녀는 서울 남산터널 앞 신호등 위에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나는 2023년 가을에 서 있었고, 신호등 건너편의 소녀는 1990년대 말 어느 계절 경기 평택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다. 사늘해서 더 맑게 느껴지는 하늘 아래 걸린 현수막. 팽팽하게 걸어 또렷이 보이는 소녀의 얼굴과, 그날의 사연을 담은 굵은 고딕체 글씨가 보는 이를 더욱 아프게 한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딸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걸며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다. 딸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등진 아내의 바람까지 등에 지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잘 웃고, 그래서 더없이 예쁜 어린 딸을 찾고 있다. 그 세월이 어느덧 24년이다. 남산뿐만 아니라 종로, 동대문, 고속도로 곳곳에서도 현수막 속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다. 아버지는 혹여 햇빛에 먼지에 바람에 비에 딸의 고운 얼굴이 일그러질까, 오늘도 어디선가 간이 계단에 올라 현수막을 바꿔 달고 있을 게다.
나는 엄마다. 그래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안다. 마흔두 살이 된 딸 혜희를 놓지 못하고 오늘도 찾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저세상에서도 딸을 찾고 있을 엄마의 애절한 마음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처음엔 돌아올 거란 생각에 애만 탄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새끼가 돌아오지 않으면 창자가 녹아 끊어진다. 그리고 창자가 녹아 텅 빈 가슴에 평생 자식을 묻고 산다.
애끊다. 창자·쓸개의 옛말 ‘애’와 잘라 떨어지게 하다란 ‘끊다’가 결합한 말이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극한 슬픔을 표현한다. 장기를 칼로 베어 내는 고통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슬프면 창자가 끊기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게다. 그래서일까. 이 단어는 소리 내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애끓다’는 ‘애’에 ‘끓다’가 붙었다. 액체가 뜨거워지면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솟아오르는데, 이 모습을 사람의 감정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애끓다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만큼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할 때 적절하다. 애타다와 같은 말로 안타까움 걱정 분노 원망의 감정과 어울린다.
지난주 본지 사회부장의 칼럼을 읽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20여 년 된 혜희씨 현수막에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더 있다는 데 안심이 됐다. 소녀가 사라진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알린다면 혜희씨 부녀의 애끊는 헤어짐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도 했다. 올해는 혜희씨 아버지가 딸을 안고 웃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부모에게 자식은 잊으라 한다고 잊히는 존재가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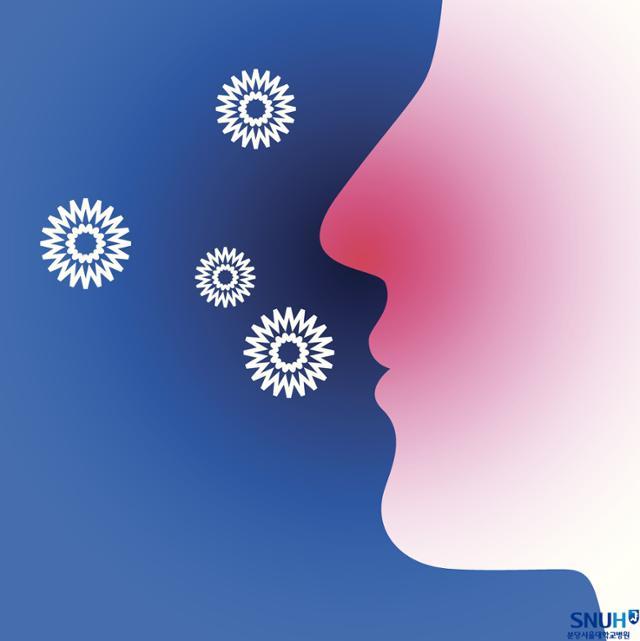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