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인데, 어린이·여성의 보호와 출소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간 충돌 문제가 있다. 다른 사례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서 전국이 홍역을 치렀다.
두 사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사례는 형사법과, 둘째 사례는 민사법과 관련 됐다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범죄자와 피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법개정 과정을 지켜보면 개정 방향성이 읽히고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뤘을 때 개정 작업이 중단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입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범죄자를 좀 더 응징할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 뒤 큰 개정은 없었는데, 이는 나름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 '법 집행기관과 수범자인 기업' 간 처벌이 형평을 이루고 있을까.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여 가급적 형사처벌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우리 법제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증거의 우월'을 기준으로 하는 민사와 달리 형사 영역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특성상 형벌 부과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관문이 되는 '고발'도 명확한 기준과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
1997년 고발지침이 제정되었을 때는 '공정위 행정처분만으로는 공정거래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발함을 원칙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범위가 불어났다. 이들 중에는 과징금 부과로 충분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원칙으로 해서 우려스럽다.
기업 행위에 대한 제재는 헌법상 형벌 원칙에 충실하면서 양자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 해외 입법례를 찾기 힘든 일감몰아주기 관련 형사처벌의 확대보다는 카르텔이나 독점 남용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선택권 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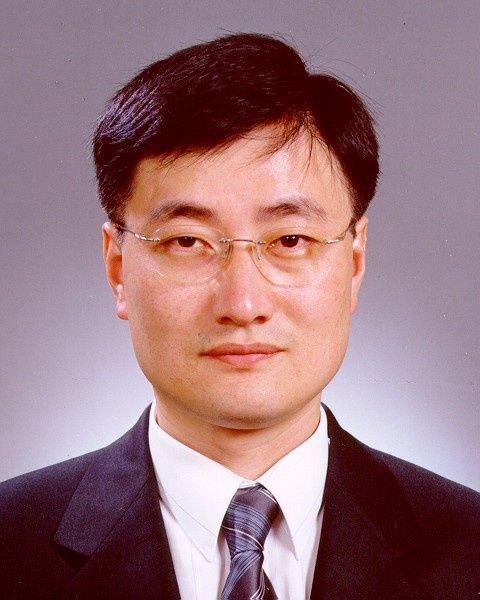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