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꽃보다 고운 김칫소. 김칫소에는 무채 파 쑥갓, 갖은양념과 함께 젓갈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난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운 사진들에 설렌다. 감나무 꼭대기에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소금물에 절인 배추와 무채 파 쑥갓 생굴 생새우 배에 마늘 생강 멸치젓 등 갖은양념을 넣고 버무린 김칫소, 막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서 서로 입에 넣어주며 깔깔대는 가족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는 빛나도록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새빨간 김치를 얹어 먹는 사진을 볼 땐 비릿하고 구수한 젓갈향이 느껴지며 충남 논산 강경장날로 추억 여행을 떠나게 된다.
“살살 좀 밀어유. 내 젓 다 터져유.” 논산 강경장날 시외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린다. 젊은 여성들은 붉어진 얼굴로 부끄러워하며 버스에서 내리기도 한다. 비릿한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젓갈 파는 어르신들은 커다란 비닐을 열어 연신 새우젓 상태를 살핀다. 그러고선 좀 편안한 말투로 한마디 또 한다. “귀한 내 젓들 다 터질 뻔했네 그랴.”
지난달 말께 서울 마포구에서도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렸다. 서울이 ‘항구’였던 시절, 서해안에서 올라온 젓갈배가 마포나루에 닿으면 새우젓 파는 사람들로 마포 인근이 붐볐다. “마포 사람들은 맨밥만 먹어도 싱거운 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마포구 염리(鹽里)동은 소금과 젓갈 파는 이가 모여 살았던 마을에서 유래했다.
‘젓’은 새우 멸치 조기 등 생선이나, 조개·생선의 알·창자를 소금에 절여 삭힌 음식이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먹는 ‘생명수’ 젖과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젇]으로 같다. 그런 까닭에 강경 시외버스 속 젓갈 할머니의 외침에 음흉한 눈빛을 보이는 이도 몇몇 있었다.
그런데 젖과 젓이 조사를 만나면 발음이 달라 정확히 소리 내야 한다. “엄마 젖을[저즐] 먹은 아기가 건강하다” “새우젓은[새우저슨] 겨울에 빛난다”처럼 발음해야 한다.
젓갈과 관련해 ‘창란젓’만큼 헷갈리는 것도 없을 게다. 명태 알로 담그는 명란(明卵)젓에 익숙해 ‘창란젓’으로 쓰는 이가 여럿이다. 명란젓과 달리 명태의 창자로 만드는 이 젓갈은 ‘창난젓’이 바른 표기다. ‘황새기젓’ 역시 잘못된 이름으로 ‘황석어젓’이 바르다. 황석어(黃石魚)는 참조기를 뜻하는 한자어로, 누런빛을 띠어 붙여졌다.
임동확의 시 ‘목포 젖갈집’에 나오는 '고집쟁이 아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게 뭔 소용이당가, 맛만 좋은면 그만이제. 바다에 나는 젖이 젓갈인께 그나저나 마찬가지 아녀.” 어문기자인 나도 아짐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니 큰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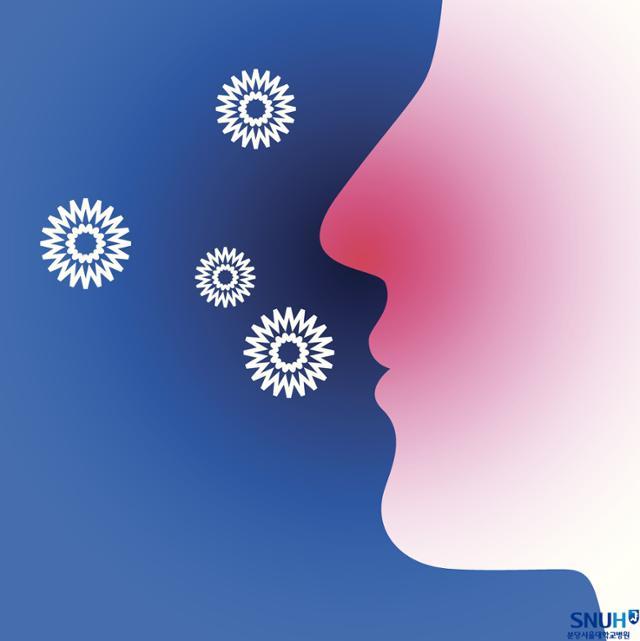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