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붕어빵엔 붕어는 없지만 팥소가 있어 맛있다. 일본어에서 온 '앙꼬'는 버리고 팥소로 말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겨울 길에서 먹어야 맛있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그 맛이 더 좋다. 붕어빵 이야기다. 언 입을 벌려 크게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함 속 뜨겁고 촉촉한 속살이 한순간 추위를 날려 보낸다. 초콜릿 색 달곰한 ‘내장’은 꼬인 감정마저도 웃게 한다.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가 고민일 뿐이다. 추워지면 주머니에 천 원짜리 몇 장을 품고 다니는 이유다.
소설가 백수린도 붕어빵 좀 먹어본 사람이다. “붕어빵은 낱개로는 구할 수 없는 빵”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을 리 없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붕어빵은 좋은 사람과 나눠 먹기 딱 좋은 간식이다. 눈 날리는 거리에서 갓 구워 나온 붕어빵을 누군가와 함께 먹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라. 행복해 절로 웃음이 난다면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화은의 시 ‘붕어빵 굽는 동네’엔 우리네 아버지들이 살고 있다. “달아오른 철판 위에서 붕어들이/몸부림칠 때쯤 귀갓길의 남편들/산란의 따끈한 꿈을 한 봉투/가슴에 품어 안는다//(중략) 붕어빵 같은 아이들의 따스한 숨소리가/높다랗게 벽지 위에 걸린다/기념사진처럼”
가슴에 품어 안는다는 것. 이보다 더 따뜻한 정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도 퇴근길 붕어빵을 품에 안고 뛰어오셨다. 다섯 아이가 둥그렇게 앉아 한 마리씩 들고 먹으면 그제야 크게 숨 한 번 쉬곤 빙그레 웃으셨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게다. 내복 바람의 아들딸들이 조금 전까지도 대문 앞에서 아버지와 붕어빵을 기다렸다는 걸.
붕어빵은 물 건너온 먹거리다. 일본의 도미빵(다이야키·도미 모양의 빵)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붕어빵이 됐다. 1950~60년대엔 미국의 곡물 원조로 밀가루가 대량 들어오면서 ‘풀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묽은 밀가루 반죽에 팥소를 넣고 구워낸 풀빵은 국화빵 붕어빵 등 다양한 모양으로 도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줬다. 지금은 팥뿐만 아니라 슈크림 치즈 잡채 고구마 등을 뱃속에 품더니 어종이 다양해졌다.
샤르르르 녹는 슈크림도 맛있지만 ‘앙꼬’ 붕어빵이 최고라는 이가 여럿이다. 나도 팥소가 들어 있는 붕어빵을 가장 좋아한다. ‘앙꼬’는 우리말 같지만 일본어 ‘餡子(あんこ·함자)’에서 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떡이나 빵 안에 든 팥’으로 올라 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어원인 일본어를 제시하며 팥소로 순화해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팥을 삶아서 으깨거나 갈아서 만든 게 팥소다.
한겨울 소리에선 맛이 느껴진다. 특히 겨울밤에 들리는 맛있는 소리는 “메밀묵~ 찹쌀떡~”이다.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배달 오토바이가 쌩 하고 오는 요즘에도 한밤중 “메밀묵~ 찹쌀떡~” 소리가 들리는 동네가 있을까. 정겨워서 몹시 그리운 소리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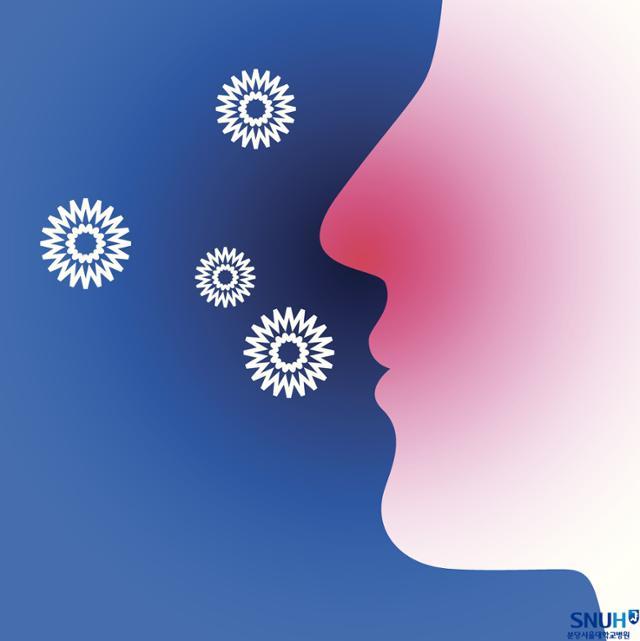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