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관 부산대 명예교수 '이타와 시여'에서
조선 후기 널리 퍼진 시여 이야기 집중 분석
시여는 무의미한 거래 아니라 사회적 거래
그 기억 찾아야 한국 사회의 불행 해결될 것

조선 후기 소설을 집중 분석해 '이타와 시여'를 내놓은 강명관 교수. 푸른역사 제공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이 지은 소설 '허생전'. 맑은 콧물 흘리던 남산골 샌님이 어느 날 마음 한번 바꿔 먹자 떼돈을 벌고 또 비현실적인 북벌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옛 소설의 대표주자다. 상거래를 통해 전근대 피폐한 농업 사회 조선을 비판한, 고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예비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타와 시여'의 저자 강명관 부산대 명예교수는 이런 해석에서 빗겨 난다. 강 명예교수가 주목하는 부분은 매점매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번 돈, 은 100만 냥 가운데 50만 냥을 그냥 바다에 쓸어 넣어 버린다는 것이다. 명백히 "화폐를 경멸하는 퍼포먼스"다. 자본 형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퍼포먼스가 무슨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예비한 거냐는 의미다.
허생은 왜 은 50만 냥을 바다에 버렸을까
동시에 그런 허생조차 돈 벌어 구제한 밥 굶는 사람들을 결국 농사짓게 한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뛰어넘는다. 허생이 돈을 쓰는 곳은 빈민 구제, 즉 '이타적인 시여'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증여(贈與)지만, 조선 후기 문헌에는 이 말이 '시여(施與)'로 나오기 때문에 저자는 시여라는 표현을 쓴다.

조선 후기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푸른역사 제공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전근대를 '증여를 기반으로 한 도덕경제'라 규정한다. '도덕'을 가져다 붙였으니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론 비웃음이 내장된 용어다. 이기적 개인의 합리적 시장 거래 대신 국가 지도자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경제, 그래서 비합리적이며 반인권적이며 낭비적인 동시에 포퓰리즘적이며 극복되어야 할 경제라는 의미에 가깝다.
저자가 이 책에서 허생전을 비롯, 조선 후기 널리 유통된 소설, 판소리, 민담 등을 집중 분석해 도전하려는 부분은 바로 이 이항대립이다. 쉽게 말해 '시장경제, 너는 뭐 그리 잘났냐'다.
'증여의 시장'을 지워버린 현대 사회
한문학자인 저자는 이를 위해 조선 후기에 유통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검토한다. 허생전을 비롯, 지금 우리 귀에도 익숙한 흥부전, 심청전은 물론,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다양한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던 '홍순언 이야기', 이제는 낯설어진 '거여객점' '그래야 내 아들이지' '베트남에 간 역관' 같은 한문 고소설, 심지어 '고려사'의 '고려세계'에 실린 태조 왕건의 집안 내력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타와 시여를 키워드로 재조립한다.

태평양의 한 부족이 엄청난 재산을 분배하는 포틀래치 행사 때 받침대로 쓰는 독수리 조각. 이 독수리는 동전을 부수는 역할을 맡는다. 허생이 은 50만 냥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행위와 비슷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인트는 3장 '이타와 시여의 작동원리'다. 상대의 아픈 처지를 이해하고, 재산은 물론 때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렇다 해서 뭔가 엄청난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어느덧 그 자체를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의 뼈대를 공감, 자기 손실, 보상 기대 부재, 자기 망각 등의 키워드로 도식화한다.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은 즉각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 돌아오는 건 대개 사회적 명성 정도에 불과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 큰 보답을 받더라도 시여 당시엔 모든 게 불명확하다.
비사회적, 반사회적 시장경제를 교정할 힘 '시여'
이런 틀은 프랑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가 1925년 내놓은 '증여론'을 떠올리게 한다. 모스의 증여론이 강조한 것은 사회적 명성이나 존중 또한 시장에서 오가는 중요한 품목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증여론' 출간 당시 막 출범한 옛 소련이 시장 그 자체를 통째로 부정했을 때 사회적 명성과 상호 존중이 오가는 증여의 시장마저 지워버림으로써 비사회적,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사회적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는 얘기다.

이타와 시여·강명관 지음·푸른역사 발행·296쪽·1만7,000원
저자는 조선 후기 이런 이타와 시여의 이야기들이 널리 퍼졌던 이유를 소빙하기의 혹독한 자연조건에서 찾는다. 흉작에 전염병에 전쟁과 반란이 잇따랐다. "1670~1971년 경신대기근 때 사망자 수는 140만 명 내외였고, 1695~1696년 을병대기근 때는 400여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타와 시여 이야기는 그렇게 숨이 가빠 헐떡대는 조선 사회를 "간신히 유지하는 힘"이었을 것이다.
저출생, 갈등, 혐오 등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위기 징후들은 지난 몇십 년간 우리를 부유하게 해준 시장경제가 사회적 명성과 존중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저자의 입안 가득 고인 질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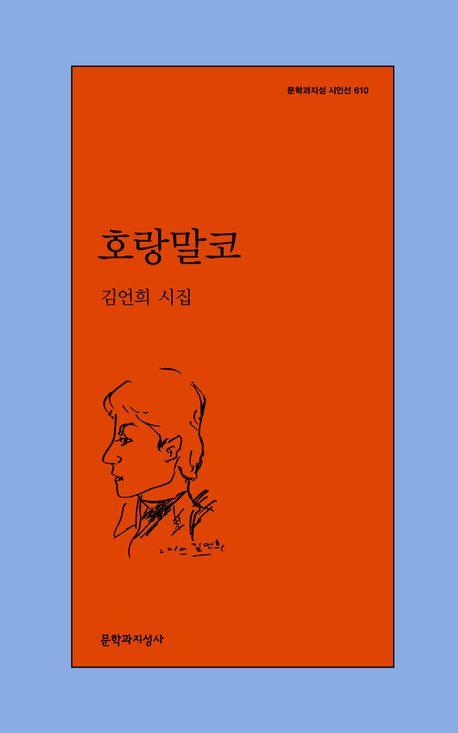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