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가지가 흰 자작나무는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비. 꼭 필요할 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내리는 비다. 여름날의 거친 폭우나 겨울의 쓸쓸한 비와 달리 이맘때 내리는 단비는 순해서 더욱 고맙다. 엊그제 내린 비에 산과 들의 연둣빛이 진한 초록으로 부쩍 성숙해졌다.
시인 박용래는 봄비를 “서서 운다”고 애틋하게 표현했다. 고정희는 "거친 마음을 적시는" 봄비가 예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강원도 정선 두위봉의 주목도 물이 올라 낯빛이 곱다. 1,400년 넘게 살아온 그곳 주목은 또 다른 천 년을 꿈꿀 게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자태다.
난생처음 고로쇠 물을 마셨다. 지리산 산청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채취한 수액이란다. 고로쇠는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水)’가 변한 말이다. 고로실나무, 수색수, 색목 등으로도 불리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엔 고로쇠나무만 올라 있다. 고로쇠나무 껍질은 골절상과 타박상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쓰인다. 그야말로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자작나무도 쓰임만큼이나 이야기가 넘쳐난다. 자작나무 하면 영화 ‘닥터 지바고’를 빼놓을 수가 없다. '라라의 테마'를 흥얼대며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의 은빛 자작나무 숲을 떠올리는 이가 많겠다. 가지가 눈처럼 하얀 자작나무는 백화(白樺)나무로도 불린다.
자작나무는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 윤기 흐르는 껍질엔 기름이 많아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탄다. 그래서 밤새 신혼 방을 밝히기도 했다. 혼례식 올리는 것을 ‘화촉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이때 화촉이 바로 자작나무 껍질의 기름을 활용한 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엔 자작나무 껍질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 신라의 대표적 유물인 경주 천마총의 ‘천마도’가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다.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일부도 자작나무 껍질에 새겼다.
나무껍질에 고개를 갸웃대는 이가 있겠다. 껍데기와 껍질. 비슷한 듯 다른 두 단어의 차이를 알아봐야겠다. 껍데기는 달걀, 조개, 굴 등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이다. 껍질은 사과, 양파, 귤, 바나나 등의 겉을 싸고 있는 부드러운 층을 가리킨다. 겉 표면이 딱딱한 것은 껍데기, 무르거나 말랑말랑한 건 껍질이다. 나무의 겉은 촉촉하고 보드랍다.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껍질이다.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늘 제자리를 지킨다. 남의 자리를 넘보거나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우거진 숲에 가면 사람이 나무를 닮는다. 누구나 숲에선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까닭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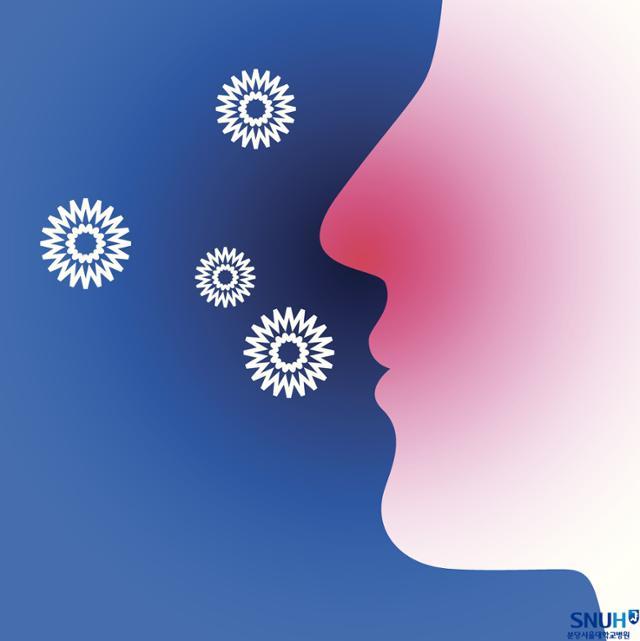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