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deep) 지식과 폭넓은(wide) 시각으로 분석하는 심층리포트입니다

4월 25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승부차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10-11로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도하=뉴시스
“2029년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 국회의원은 당내 대책 회의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며 “축구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경제도 뒤처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 속도도 빠르지만, 이 지역 축구 성장세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항서 신드롬’의 베트남이 수년 전 급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더니, 최근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국가들도 축구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4월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U23 AFC 카타르 2024 아시안컵 준결승'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 자카르타=AFP 연합뉴스
동남아 축구, 암흑기와 반전
1970년대 동남아시아 축구는 우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지금이야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이 동남아팀에 덜미를 잡히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메르데카컵(말레이시아), 킹스컵(태국)에 매년 국가대표팀을 보내 실력을 겨루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사회가 정치 혼란과 경제난, 승부조작 등으로 얼룩졌고, 반면 우리 축구는 발전을 거듭하며 수준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축구는 서서히 암흑기를 벗어났고, 한국 축구는 어느덧 이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던 성인대표팀이 지난 1월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겼고, 지난달 열린 AFC U23 아시안컵 8강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꾸린 올림픽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덜미를 잡혀 조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성인대표팀 61년 만의 아시아 정상 등극과 올림픽대표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을 모두 접고 말았다.
동남아 축구의 기세가 국가대표팀에서만 유난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 대륙 프로축구 강팀들이 모여 치르는 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도 동남아 지역 클럽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22년 ACL에서는 16강에 오른 동아시아 8개 클럽 가운데 3곳(말레이시아 조호르, 태국 빠툼, 홍콩 키치)이 동남아시아 리그 소속이었다. 이외에 라이언시티(싱가포르) 방콕 유나이티드(태국) 같은 팀이 ACL에서 K리그 클럽을 포함한 아시아 강호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더 이상 대이변이 아니다.

지난 4월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이 퇴장을 당한 뒤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10-11로 패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동남아 경제ㆍ사회 발전과 축구
동남아시아 축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 지역 경제의 활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 국가의 주요 스포츠는 사회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층의 증가와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진 나라들이 뿜어내는 역동성은, 해당 국가 스포츠 발전의 중요한 땔감이 된다. 그리고, 축구는 전 세계가 향유하는 인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자국의 위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잣대로 인식된다.
실제로 축구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종목이다. 전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회원국 수(211개)는 스포츠 분야 최대 축제인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원국 수(206개)를 뛰어넘는다. 각종 이벤트가 일상적으로 열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각 국가의 성과가 매달 계량화돼 ‘FIFA 랭킹’으로 전시된다. 특히, 지역 예선을 거쳐 월드컵 본선 진출 최종 32개 팀(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 팀)에 포함되는 것은 국가적 성취로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매개가 된다.

인도네시아 축구국가대표(U23) 선수들(붉은색 유니폼)이 2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2024 아시안컵 3, 4위전 이라크와 경기에서 상대 공격을 수비하고 있다. 도하=AFP 연합뉴스
이렇듯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진 나라에서는 축구로 돈과 권력이 모이는 현상을 수반한다. 군사독재정권의 그림자가 짙었던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예외로 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축구는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뽐내고 홍보하기 위한 매개가 된다. 최근 동남아 축구 리그와 축구협회에 돈과 권력이 집중되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그 방증이다. ACL과 FIFA 월드컵이라는 커다란 2개의 목표를 세우고, 프로축구와 대표팀 축구에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4월 29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할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카타르=신화통신 뉴시스
박항서ㆍ김판곤ㆍ신태용… 한국 지도자들의 활약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겪은 정치ㆍ경제적 진화를 축구에도 투영한다. 경제 발전과 스포츠 분야의 성취를 동시에 일궈낸 한국의 사례는 그들이 한국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배경 중 하나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크게 성장시켰고, 지금은 말레이시아가 김판곤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인도네시아가 신태용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영입해 괄목할 만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중이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뒤 프랑스 출신의 필립 트루시에 전 일본 대표팀 감독을 영입한 베트남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오히려 추월당하자 다시 한국인 지도자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홍콩 명문클럽 키치(김동진 감독), 싱가포르 최대 클럽 라이언시티(김도훈 전 감독) 등도 한국인 지도자에게 팀을 맡겼다.

동남아 국가 FIFA 랭킹 변화
선진 축구 도입 → 아스나위·분마탄 등 유망주 발굴
그들은 또 적극적으로 선진 축구를 도입하고자 했다. 한국의 K리그나 일본의 J리그로 유망한 선수들을 내보내 아시아 정상권 축구를 경험하게 했다. 태국의 A대표팀 주전들과 인도네시아의 연령별 대표팀 인재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리그를 경험하며 아시아 최상위 축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 K리그를 경험하며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주장으로 성장한 아스나위, 일본 J리그에 수년 동안 최상급 풀백으로 평가되며 리그 우승까지 따낸 태국 대표팀 주장 티라톤 분마탄이 대표적인 사례다.

K리그 안산그리너즈에서 활약한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스나위 선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텐백' 버리고 '맞불 축구'로 성과
여기에 양국의 유능한 감독들에게 국가대표팀과 자국 클럽의 지휘봉을 맡긴 것도 아시아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됐다. 이 과정에서 FIFA랭킹 100위권 안팎의 동남아팀들은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할 때에도 이른바 ‘텐백’이라 부르는 걸어잠그는 전술 대신 맞불 축구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우리를 상대로 치른 월드컵 예선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태국 대표팀이나, 최근 U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려 21개의 슈팅을 때리며 한국(8개)보다 2.5배 많은 득점 시도 끝에 4강 진출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그렇다.
'교포 선수' 영입 등 인재 확충
이게 전부는 아니다. 21세기 들어 필리핀이 앞장선 ‘교포 선수 영입’은 다른 동남아 축구 대표팀이 벤치마킹해 뒤따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선수들의 합류는 자신들만의 색채 위에 피지컬과 테크닉까지 더해 동남아 축구의 발전 속도를 더욱 높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성인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은 대회가 없는 기간에 유럽을 돌며 교포 선수 영입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의 평균 신장은 4년 사이 173cm(2020년)에서 177cm(2024년)로 높아졌고, 2020년 AFC U23 챔피언십 본선 무대에도 오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는 2024년 AFC U23 아시안컵 4강에 오르는 대성과를 일궈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지난 1월 AFC 아시안컵 본선에서 16강에 올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사상 첫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동남아 축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동남아시아는 ‘유럽 강국의 식민지’라는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보다 빠르게 축구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싱가포르에서는 1892년에 축구협회가 설립됐고, 필리핀(1907년), 홍콩(1914년), 태국(1916년) 역시 우리나라(1928년)보다 앞서 축구 단체가 만들어졌다. 1954년 AFC 설립 당시, 창립 멤버에는 한중일과 위 나라들 외에 미얀마, 베트남도 포함돼 있다.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유구한 ‘축구 역사’라는 토대 위에 최근 경제 발전이 계속되면서 축구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는 것이다. IMF가 예측한 2029년 GDP 순위 역전이 어쩌면 FIFA 랭킹으로도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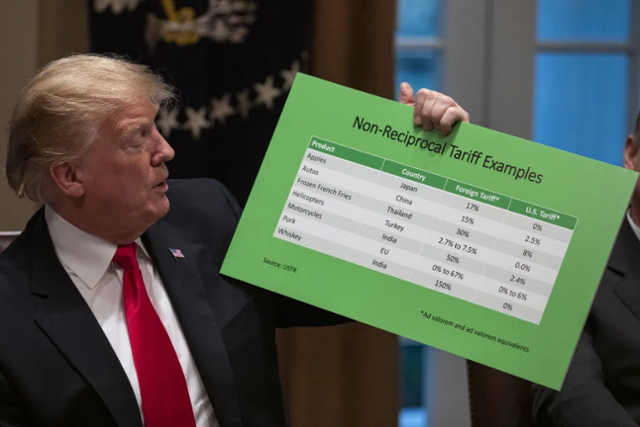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