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도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 4년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년엔 전문의 배출이 거의 올스톱 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는 만큼, 정부는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현재로선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추가 당근책 자체가 없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허용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이미 철회했으며, 수련 재지원 기회까지 완전히 보장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년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의대별 자율을 보장해 1,509명까지 줄였는데, 역시 꿈쩍 안 했다. 이쯤 되면 최소한 올해, 앞으로 1년 이상 전공의가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다.
현재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하겠다.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떤 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대형병원의 업무 마비가 장기화하는 만큼, 1·2·3차 병원(중증·응급만 담당하는 4차 병원 지정 포함)의 역할 재정립과 원활한 환자 분산정책이 최우선임은 자명하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 완화 및 전문의 체계 구축, 의사 일을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간호법 제정), 개원 면허제 도입, 실손보험의 과잉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진료 혼합 금지 등 정부가 이미 밝힌 의료개혁 과제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 전문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놓고 인건비 부담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만일 뿐이다. 정책과제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 독일은 비급여 의료항목이 건강보험 수가의 2.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급여 과잉이 심한 한국도 검토할 만하다.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조차 어려웠던 의료개혁이 이참에 성과를 낸다면, 고통 끝에 다디단 열매가 될 것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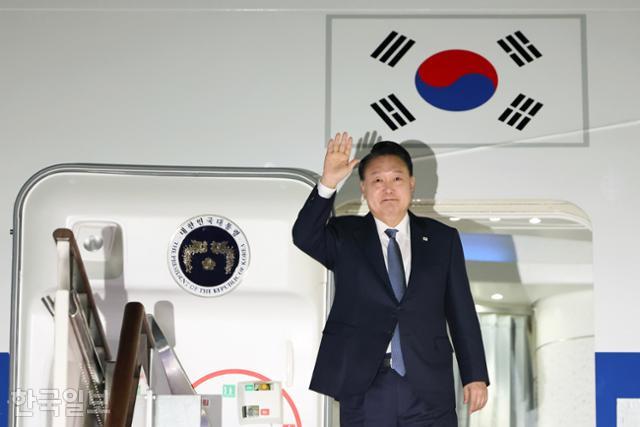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