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북 의성군 성광성냥공장에 진열된 다양한 성냥갑들.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는 '갑'이다. 담뱃갑, 비눗갑, 우유갑 등이 있다. 박시몬 기자
옛 직장 선배가 서울 근교로 이사를 했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데다 올봄 직장을 잡은 아들이 독립해 나간 후,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란다. 집 크기를 줄이니 살림살이도 단출해졌다고 좋아한다. ‘살림’과 ‘살리다’가 만난 말 살림살이. 이 말은 언제 만나도 참 반갑다. 집알이 가던 날, 웃음을 부를 집들이 선물을 고르느라 한참 고민했다.
집들이 선물엔 집주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예전엔 집안이 술술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살림이 부글부글 일어나라고 세제를, 집안 경기가 활활 타올라 부자가 되라고 성냥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갔다. 요즘엔 화장지와 세제는 여전히 인기인 반면 성냥은 사라진 듯하다. 그러고 보니 일이 바쁜 탓인지, 마음에 여유가 없는 탓인지 집들이 자체가 뜸하다.
선배네 집들이에선 '유엔(UN) 성냥' 이야기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팔각형 상자에 든 이 성냥은 국내 첫 음란물 재판으로 유명하다. 부산의 한 성냥공장이 에스파냐 화가 고야의 작품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인쇄해 판매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세계적인 명화는 한순간 음란한 그림으로 전락했다. 1970년의 일이니 그럴 만도 하다.
성냥갑과 성냥곽, 둘 중 ‘바른 말 찾기’ 내기를 했다. 나를 뺀 다섯 명 중 두 명이 '곽'을 선택해 커피를 샀다.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는 갑(匣)이다. 고유어 ‘곽’은 갑에 밀려 생명력을 잃었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성냥곽'이 아닌 성냥갑이 표준어에 오른 이유다.
담배가 담긴 것은 담뱃갑, 비누를 넣는 건 비눗갑이다. 둘 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깝]으로 소리가 나 사이시옷을 받쳐 적었다. 우유갑은 세 음절의 한자말이라 사이시옷이 없다. 네모난 상자에 들어 있는 ‘티슈’ 역시 갑 티슈가 바른 표기다. 한 단어가 아니므로 ‘갑 티슈’로 띄어 써야 한다.
담배와 성냥을 세는 단위는 개비다. 가늘게 쪼갠 나무토막이나 기름한 토막의 낱개를 말한다. 언중이 많이 쓰는 '가치, 개피, 까치’는 표준어가 아니다. 그런데 '가치담배'는 갑에 넣지 않고 낱개로 파는 담배로 국어사전에 떡하니 올라 있다. '가치'는 안 되고, 가치담배는 된다니 참 얄궂다. 그나저나, 집알이 갈 때 들고간 선물이 궁금하겠다. 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쌀 한 가마니(80킬로그램) 싣고 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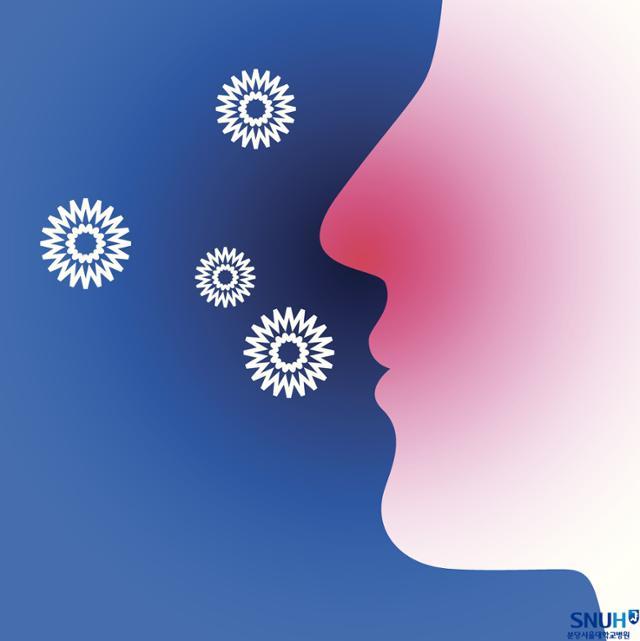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