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욕설과 외계어가 날뛰는 세상. 두런두런 이야기하듯 곱고 바른 우리말을 알리려 합니다. 우리말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작은 기차역.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역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다. 역무원 없이 운영되는 임기역엔 무궁화호만 하루 두 번 선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차역엔 여러 감정이 떠다닌다. 반가움, 아쉬움, 설렘, 두려움….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강원 산골의 작은 기차역엔 이맘때면 톱밥난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엔 '1985년 10월 26일, 첫눈 내리다'라는 적바림이 남아 있다.) 딸을 도시로 보내는 아버지는 쿨럭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딸 걱정 때문인 걸 다 알았다. 추운 척 손을 비비며 난로 옆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같은 까닭이었을 게다. 기차 시간이 꽤 남았지만 타는 곳으로 미리 나간 딸도 훌쩍이고 있었으니까.
서울역은 30여 년 전 산골의 역과 많이 다르다. 환하게 웃으며 표를 받던 차장 아저씨는 눈을 씻어도 볼 수 없다. 차표를 내고 나가면 키 작은 화분에 수줍게 앉아 있던 채송화도, 역 담벼락 아래 한 무더기 피어 있던 구절초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만 바삐 오갈 뿐이다.
역 안에서 보고 듣는 말이 변한 건 참 반갑다. 대합실은 ‘맞이방’으로 바뀌었다. 매표소는 ‘표 사는 곳’, 승강장은 ‘타는 곳’, 출구는 ‘나가는 곳’으로 표시돼 있다. 개찰도 ‘표 확인’으로 잘 다듬어졌다. 굳이 어려운 다른 나라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우리말로도 충분하니까.
맞이방은 특히 반갑다. ‘맞이’와 ‘방’이 만났다. 오는 이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가는 이를 배웅할 수도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일본식 한자어 '대합실'을 밀어내 무척 고맙다. 서울역 등 전국의 모든 기차역에선 “표를 사신 분은 맞이방에서 기다려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신선한 말인가. '맞이방'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아직도 오르지 못한 건 아쉽다.
역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꼬부랑말들도 쉬운 우리말로 할 수 있다.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전동장치인 에스컬레이터는 ‘자동계단’이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무빙워크는 ‘자동길’,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으로 쓸 수 있다. 낯선 소리를 버리니 말하기가 한결 편안하다. 어르신도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예산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가는 곳마다 꽃들이 환하게 맞아주었다. 파란 하늘 아래 어깨를 겯고 서 있는 나지막한 건물들도 정겨웠다. 소쿠리전집, 동백다방, 미소다방 등 우리말 간판을 머리에 인 모습이 예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득 '기분 꽃 같네'라는 꽃집 이름이 떠올라 빙그레 웃었다.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가을날, 모든 이의 기분이 꽃같이 곱길 바라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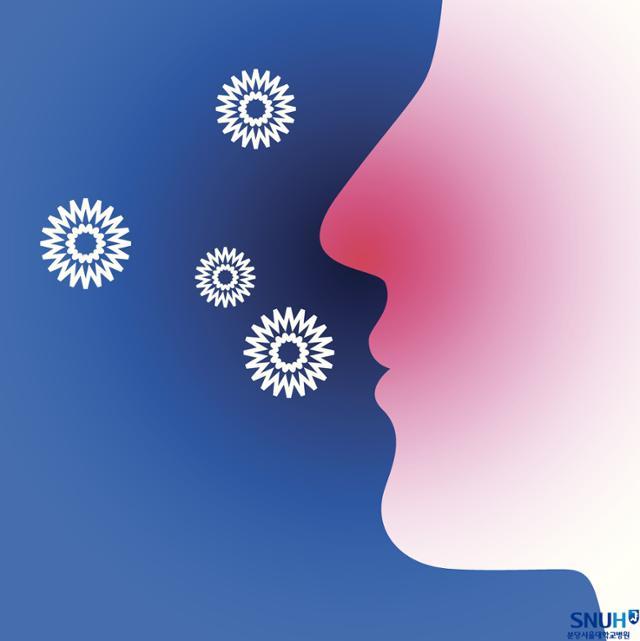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