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모습. 이한호 기자
‘사상 초유’와 ‘헌정 최초’ 수식어가 흔해 빠진 세상이 됐지만, 3일 대통령 관저에선 정말로 진귀한 장면이 펼쳐졌다.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헬름협곡 전투에서 마법지팡이를 앞세워 길을 열었던 것처럼,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내밀며 견고한 요새의 좁은 길을 뚫어내고 있었다. 지도에도 안 나오고, 근처에만 가면 GPS가 먹통이 된다는 곳. 대한민국서 가장 엄중한 경호경비를 받는 현직 대통령 거처에서 말이다.
□ 목표까지 200m. 영장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병력이 등장했다. 여기서 하마터면 활극이 벌어질 뻔했다. 경호처가 진입을 불허하자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 했다. 경찰대 2기 박종준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 경찰 수사관들은 아마도 무장하고 있었을 경호관들 앞에서, 현직 경호처장이자 자신들 옛 상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고 했다. 목숨을 걸어야 했을 수도 있었던 시도였고, 경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다.
□ 13만 경찰관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경찰은 권력의 외풍에 이리저리 나부끼기만 했던 조직이다. 경찰관이 검사보다 ‘깡’이 없어서는 아니었다. 조직의 그늘진 역사와 압정형 계급 구조가 구성원을 정권에 휘둘리게 했다. 계급정년까지 있으니 간부는 승진에 목숨을 건다. 검사가 사표를 던지면 ‘변호사님’이지만, 서장이 옷 벗으면 동네 아저씨일 뿐이다. 사람도 많고 입직 경로가 다양하니 단합도 안 된다.
□ 그러나 내란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자세에선 결기가 보인다. 무려 ①현직 청장을 ②내란 혐의로 ③긴급체포했다. 스스로 극약을 삼키고 나서니 성역이 사라졌다.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고, 권한대행 요청(관저 경비 강화)도 물리쳤다. 피의자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와 경호관 뒤에 숨어 있다. 법리 검토와 수싸움만큼 투지와 기개가 필요하다. 에드거 후버의 FBI처럼 선출직을 무시할 정도로 비대해선 곤란하지만, 바람에 쉽게 눕지 않는 강단도 수사기관에는 필요하다. 이 싸움은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산과 경험이 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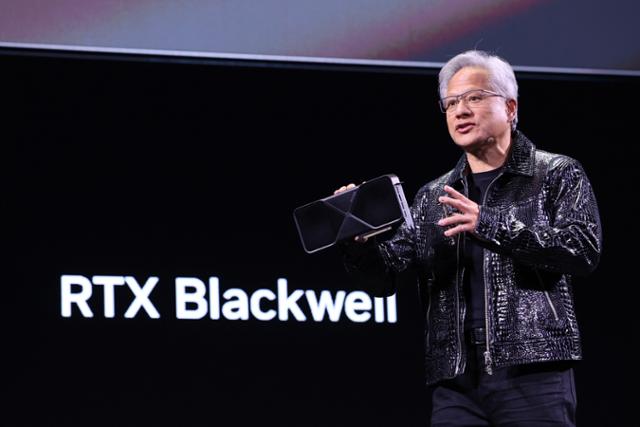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