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다섯 차례의 대국이 1대 4, 인간의 패배로 끝났다. 예상보다 강한 인공지능의 힘을 지켜본 후 많은 사람들은 인류 미래의 불확실성을 실감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경우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 직업 중 상당수가 소멸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일자리의 소멸은 우리에게 끝없는 불안감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 인간은 일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사라질 직업을 예측할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이 법률가이다. 아마도 법률가의 일이 까다로운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법률가의 숫자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직업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률가는 단지 지능과 연산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가 미국 사회학자의 책(‘케어의 저편’, Beyond Caring)을 빌려 설명한 것처럼, 전문직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참혹한 불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훈련 받는다. 의사와 간호사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냉정하게 치료 행위를 계속하고, 법률가는 참혹한 범죄와 거짓으로 시작된 다툼을 법률에 의지해서만 바라봐야 한다. 그 일의 속성상 전문직에게는 불행의 루틴화 또는 일상화(routinization of disaster)가 필요한 것이다. 때때로 이것이 전문직을 비인간적인 부류로 비춰지게 한다. 그렇지만 많은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후 그 사회학자가 결론 내린 것처럼 전문직 역시 감수성을 가진 인간이며 냉혈한이거나 비도덕적인 인간은 결코 아니다. “직업상 그들의 한계는 우리와 다르지만, 그래도 한계는 있는 것이다.”(오에 겐자부로, 채숙향 옮김, ‘말하고 생각한다 쓰고 생각한다’에서 재인용). 인간으로서 한계를 갖고 서비스의 대상인 다른 인간과 공감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은 인공지능과 다르다. 법률가도 마찬가지다.
이세돌 기사가 그랬듯이 법률가도 때때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도전한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밤새워 재판을 준비한 변호사는 현재의 판례로선 승소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더라도, 그 재판을 포기하지 못하곤 한다. 범죄자를 단죄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관이 오판의 가능성에 밤새워 고민하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역시 그들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다른 인간과 공감할 수 있다는 건 민주적 사법 체계의 중요한 전제이다. 근대의 인간은 사법 체계에서 세습 귀족을 배제하고 시민들로 법률가를 충원했다. 그 후 법원은 신이나 왕의 이름을 빌리지 않은 채 오로지 인간인 법관의 이름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는 근대 시민이 민주주의란 체제를,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이 다른 시민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공지능이 사법 기능을 대체할 경우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수 없다는 서민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적은 맞다. 우리가 사법의 제도적 의의로서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를 내세우는 것도 같은 뜻이다.
이렇듯 지금의 사법 체계를 선택한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가의 운명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 제도가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는 사명을 놓치고 시민의 신뢰를 잃을 때 법률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시민이 법률가보다는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믿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걸 더 편안하게 느끼며 법률가를 동료인 시민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시민은 인공지능으로 법률가를 대체하려는 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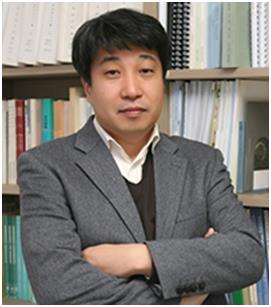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