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자를 유흥가 앞에 조신하게 세워둔 ‘한국 여자’. 이 작품은 명품 브랜드 디올(Dior)이 시대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에게 자사의 상품을 재해석하도록 의뢰해 제작한 것이다. 작품이 실린 전시회 제목은 ‘레이디디올에즈씬바이서울(Lady Dior as Seen by Seoul)’. 작가는 광주 충장로에서 여대생을 촬영한 뒤 불 켜진 간판을 합성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 젊은 세대의 초상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의 화장품 가게와 식당은 사라지고 ‘룸비 무료’ ‘놀이터 룸 소주방’ 등 유흥가만이 남았다. 전시회 제목을 띄엄띄엄 한국어로 발음하면서 “이게 뭔 말이지”하던 의문이 작품 의도를 볼 때도 똑같이 들고 말았다. 이게 대체 뭔 소리랍니까.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뭔 소리’는 이렇게 해석되었다. 한국 여성을 명품 백을 사기 위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김치녀’로 묘사했다!
작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의 특성상, 돼지껍데기 집이 놓여있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흔하디 흔한 유흥가에서 무한 리필되는 돼지껍데기처럼 소비되는 명품 백을 읽을 수도 있었다. 혹은 OECD 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그 이유가 근속연수, 교육수준, 직종이 아니라 단지 여자이기 때문인 한국적 상황을 비꼰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 ‘한국 여자’는 청 테이프에 다리가 묶인 채 트렁크에 갇힌 여체를 표지로 내건 ‘맥심 코리아’나 ‘자극을 가한 여자가 아름답다’고 말한 일본 사진작가 아라키 노부요시의 ‘로프’ 사진처럼 명백한 여성 혐오는 아니다. 그러나 거리의 ‘룸’마다 성의 거래가 일어나고 젊은 여성이 지극히 성애화되는 사회에서 하필이면 유흥가와 젊은 여자의 조합이라니. 더군다나 여성 혐오가 판을 치고 페미니스들이 테러리스트들보다 위험하다고 설레발 치는 현실에서 말이다. 북새통 시장을 오가는 젊은 여자나 유흥가 앞에 선 ‘배추머리’ 중년 여성이 디올 백을 들었다면? 이미지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의 상투적이고 외피적인 재현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깨는’ 의외성이다.
이제 여성들은 묻는다. 술집에서 일해 가방을 샀다면 그 성을 산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디올 백을 산 돈은 누구의 지갑에서 나왔을까. 이탈리아의 타이어 회사인 피렐리는 50년 동안 저명한 사진가와 모델을 섭외하여 VIP를 위한 한정판 ‘핀업걸’ 달력을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으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달력을 채웠고 그들은 테니스 선수, 코메디언, 예술가 등으로 다양했다. 바야흐로 여성 운전자와 자동차 구매자가 늘면서 여성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달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인디 음악가의 곡에서 “자궁냄새가 난다”로 말한 남성 보컬에게 여성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다. “인디 씬을 누가 먹여 살리는지 생각해보세요.”
디올은 사석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한 디자이너를 자르고 할리우드 남녀 배우들의 임금격차를 지적한 ‘헝거게임’의 제니퍼 로렌스를 모델로 채용했다. 아마 일을 의뢰한 아티스트에게 전권을 부여하기도 했고 한국의 ‘룸’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 결과 디올 백은 한국에서 ‘룸녀백’으로 등극해 “디올 백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는 성토를 받게 됐다. 오매불망 모은 돈으로 명품 백을 장만했더니 한 순간 격이 떨어져버린 기막힌 상황. 토닥토닥, 괜찮아요. 루이비통과 베네통은 구별 못 해도 ‘페미당’에 가면 여성 혐오 정치인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무성, 김을동, 황우여 님이 탑 3를 차지했다. 바로 내일, 여성들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디올에 항의 전화를 걸고 ‘한국 남자’ 패러디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기승전 ‘투표’!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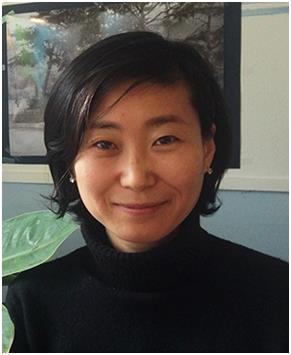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