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박주민(왼쪽 두번째)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를 되돌려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보자. 다음은 전적으로 공상의 세계에서 벌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2017년 말 19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재집권에 성공한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로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새누리당이 앞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 덕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 최씨는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했고 기사는 곧 삭제됐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도 줄줄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대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2심 판결을 뒤집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준다. 영화 '기생충'도 결국 제작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있던 투자·배급사 CJ E&M이 영화 ‘1987’을 대선 직후 개봉하려 했던 게 화근이었다. 봉준호 감독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두 번째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농부가 됐다. 최씨는 광고업계와 스포츠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새누리당 대표에 선출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 선수는 2020 도쿄올림픽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나 예선 탈락했다.」
허무맹랑한 상상처럼 들리겠지만 사법부까지 쥐락펴락했던 이전 정권의 사례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권력에 중독되면 어떻게든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내고야 마는 게 정치인 아니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언론의 자유가 쪼그라들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이 법안으로 언론의 오보나 가짜뉴스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좀 더 합당하게 구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이 언론에 왜 비판적인지 언론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이나 과정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우선 언론 보도의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언론을 무릎 꿇리려는 의도가 앞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했던 말을 들어보자. "(국회의원은)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을 관계입니다. 지방의원들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이 언론한테 얼마나 당합니까." 권력자들이 언론의 비판에 맞서 갑의 위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걸까.
여당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간다. 그런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언론계뿐만이 아니다. 언론개혁을 외치는 시민단체마저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는다. 이득 볼 것 하나 없는 해외 언론단체까지 비판 성명을 냈다. 정 의원은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만 의사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진 않는다.
정작 가장 걱정스러운 건 법안 자체라기보다 여당의 폭주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의 의견은 들을 것도 없다'는 인식이 여당 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여당 86세대 의원들은 오래전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훈장으로 삼는다. 그런 그들이 정작 권력을 잡은 후 과거 그토록 비판했던 정권의 잘못을 반복한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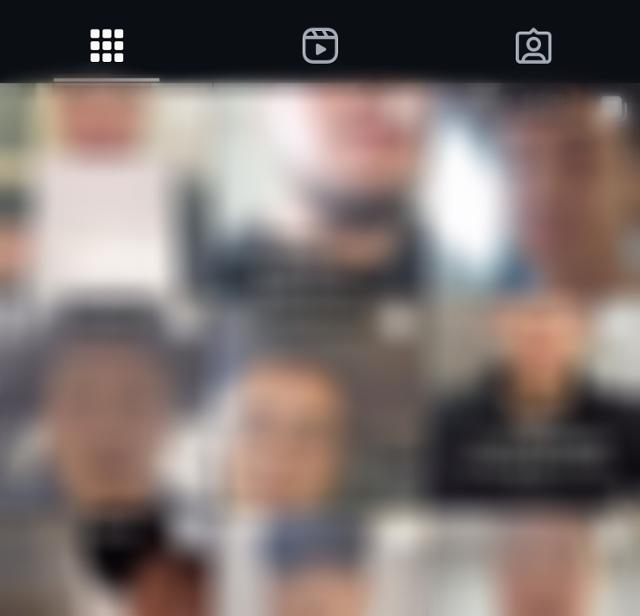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