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7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전엔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아차 사고’라고 했죠.”
철도노동자 출신인 노동계 인사가 "철로에서 일하다 죽는 사람이 매년 10명씩 나오던 시절의 이야기"라며 들려준 말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흥미로웠다. "사고가 나면 재발 방지 매뉴얼이 내려왔는데, '정신 차려'라고 통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법이니, 정신을 차리고 일하도록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라는 게 재발 방지 대책이었다는 얘기다. 산재사고를 '졸음 운전'과 비슷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던 셈이다.
그보다 진화한 버전이 '안전교육 강화'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고 하청업체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쏟아낸다. 물론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안전교육은 책임 회피용 수단이 되곤 한다. 안전교육을 시켰는데도 사고가 났으니, 결국 작업자의 '아차 사고 아니냐'는 식이다.
사실 이런 논리는 통계 하나에 간단히 무력화된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10.1명으로 영국(0.4명)보다 20배 넘게 많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영국 노동자보다 20배 더 부주의하고, 20배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걸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자부하는 한국이 ‘산재사망률 세계 1위’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노동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인식에 균열을 가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3년 전 발생한 '김용균 참사'다.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사측은 "매뉴얼에는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으란 내용이 없다"며 김씨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김용균 특조위'는 784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통해 전혀 다른 진실을 공개한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침에 따라 작업에 임했으나 2인 1조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특조위는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하청 구조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근본적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고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불러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밑거름이 됐다.
그런데 애써 나아간 역사의 시계가 되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고 말끝을 흐리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했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아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다. 졸음 운전 같은 실수가 비참한 사고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치이고 끼이고 밟히고 눌려 죽어도 '정신 차려' 한마디면 끝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기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김용균'을 잃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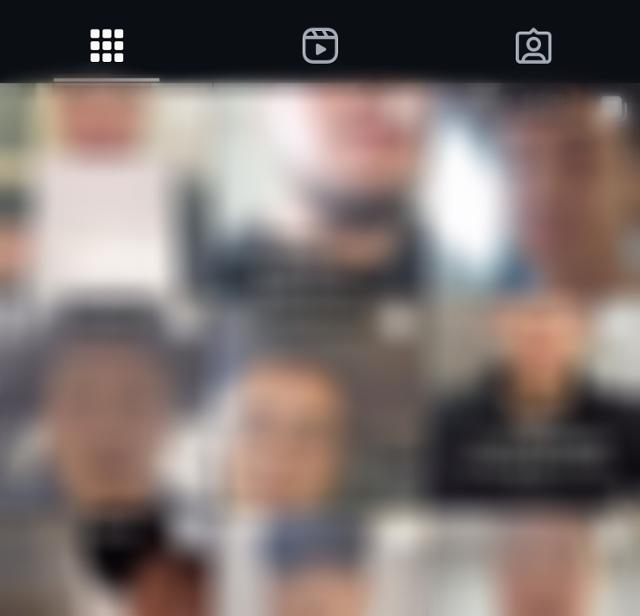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