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윤이나가 7월 17일 경기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KLPGA 로고가 적힌 타월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KPLGA 제공
192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US오픈 최종 라운드. ‘골프의 전설’ 바비 존스(본명 로버트 타이어 존스 주니어)는 1타차 우승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경기위원을 불렀다. 그는 러프에서 샷을 하기 위해 어드레스를 하는 동안 볼이 움직였다고 자진 신고했고, 1벌타를 받았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음에도 잘못을 고백한 것이다.
존스는 결국 이 벌타로 인해 공동 선두로 연장전에 들어갔고, 끝내 준우승에 그쳤다. 존스는 경기 후 자신의 행동에 칭찬이 쏟아지자 “규칙대로 경기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은행에서 강도 짓을 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칭찬하던 이들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들었다.
골프는 경기 중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다. 경기위원(Rules Official)이라 불리는 이들이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하지만 여타 스포츠의 심판과는 다르다.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도중 선수들이 룰이나 구제 방법 등 애매한 상황을 문의하면 그때 나서 정확한 판정을 해준다. 그래서 골프는 양심이 곧 심판이라고 한다. 존스는 양심이 심판이라는 골프의 기본 정신을 몸소 실천해 보였다.
최근 한국 골프계를 발칵 뒤집은 윤이나(19)의 ‘오구 플레이’와 ‘늑장 신고’는 촉망받는 신인이 골프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행동이어서 파장이 크다. 단순히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버려져 있던 볼을 자신의 것인 양 속였고, 이마저도 한 달가량 감추다 의혹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 되자 뒤늦게 자진 신고한 모양새다. 그사이 윤이나는 대회 우승까지 차지했다. 그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기 잠정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대한골프협회(KGA)는 지난 19일 윤이나에게 3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언뜻 보기에 3년이라는 자격정지는 중징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3경기 출장 정지다. KGA가 주관하는 대회 중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의 윤이나가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한국여자오픈 1경기뿐이다. 겨우 3경기 출장 정지는 선수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상징적인 징계 수준이다.
이제 바통은 KLPGA로 넘어갔다. KLPGA는 KGA의 결정을 참고해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KLPGA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260m에 달하는 시원시원한 장타와 ‘닥공’ 스타일의 신인은 KLPGA로서는 새로운 스타로 만들고 싶은 재목일 것이다.
특히 KLPGA의 징계는 KGA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KGA와 같은 3년 징계면 100여 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제 막 피어나는 대형 신인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까운 재목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맞는 벌은 명확하게 내려져야 한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징계 없이 온정주의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할 경우 제2, 제3의 윤이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특정 선수들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적지 않은 선수들의 부정행위에 정직한 선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면 KLPGA 투어 전체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KLPGA가 ‘양심’이라는 골프의 기본 정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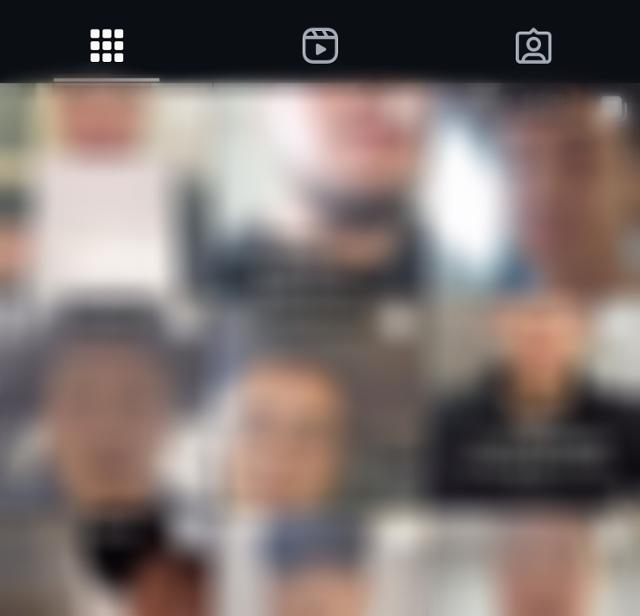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