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의 주인공 준성은 60대 뇌졸중 아버지를 돌보는 26세 청년이다. 고3 때 아버지가 쓰러진 후 7년째다. 주간엔 아버지를 돌보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나간다. 간병 도움을 받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아버지는 번번이 탈락한다. 준성은 물리치료사가 돼 병원서 일하는 게 꿈이지만, ‘독박’ 간병 굴레에서 시험을 준비할 여유는 없다. 어느 날 준성은 이웃이자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50대 명주에게 “자격증도, 스펙도 없이 20대가 가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다 이내 “아버지는 하나뿐인 가족”이라며 마음을 다잡는 준성을 보며, 간병 '선배' 명주는 속으로 “고아가 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도 소설만큼 비극적이다. 박모(25)씨가 치매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건 12세 때.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돌아와 할머니 식사, 목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친구들과 노는 건 사치나 다름없었다.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치매가 중증으로 발전한 대학생 땐 2년 휴학하고 종일 간병에 매달렸다. 해외봉사도, 대학원도 모두 포기했다. 박씨는 지난 10년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했다. 그러다 집에 큰불이 나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며 박씨는 간병에서 벗어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그는 “안 좋은 일이 생겨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다.
간병이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된 건, 사회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기 때문이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던 22세 청년이 생활고를 이유로 부친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보자. 주무부처 장관은 “여러 복지제도가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장관 말대로 청년이 운 좋게 대기 경쟁을 뚫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1일 2만 원)’를 받아 간병비(10만~15만 원) 부담을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까지 받았다면 병원비가 2,000만 원에 달하진 않았을 거고, 청년이 주변에 ‘쌀값 2만 원만 빌려 달라’ 도움을 청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소설 속 준성처럼 청년이 생계ㆍ간병을 떠안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선 후보부터 총리까지 국가의 간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지난해 5월 60대 여성이 평생 돌봐온 중증장애인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4월 서울 서초구에선 60대 남성이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 2018년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기사를 쓴 서울신문 기자들은 “사회가 우군이 돼주지 않으면 비극은 뫼비우스 띠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적중한 셈이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베이비부머가 아프기 시작하면 진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간병비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사회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대신 돌봄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고, 중산층까지 서비스를 개방하는 시장화 방침을 천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은 없었다. 우리 사회를 흔히 '죽어야 바뀌는 사회'라고 한다. 간병 대책은 얼마나 많은 죽음이 더 쌓여야 만들어질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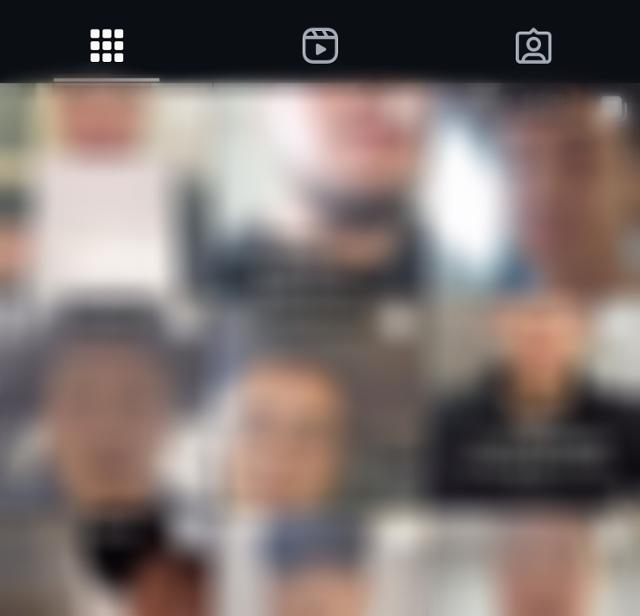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