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반이민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불을 지른 버스와 승용차 옆을 지나고 있다. 해당 시위는 같은 날 더블린 한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이민자라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일어났다. 더블린=AP 연합뉴스
며칠 전, 경기 파주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속보에 이어 ‘외국인 피의자’가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적지 않은 기사가 제목에 피의자의 국적을 밝혔고, 검거 소식 못지않게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묘한 안도감을 줬다. 왜 이렇게 느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끄럽게도 근원엔 구별 짓기가 있었다. 흉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끔찍한 범죄자는 나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데서 오는 안도였다.
이 기사에 쏟아진 “해당 국가의 사람을 몰아내라”라거나 “이들만 추방하면 한국 범죄율이 반으로 줄 것”이라는 반응 역시 이런 감정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집단화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폭력으로 쉽게 이어진다. 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반대한다’가 되고, 결국 ‘박멸하자’가 되는 건 순간(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말이 칼이 될 때')이라는 설명이다.
폭력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현실이 됐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대규모 폭력시위는 앞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용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어났다. 같은 날 50대 남성이 학교에서 나오던 아이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쳤다. 이후 온라인에서 이 남성이 무슬림 이민자라는 주장이 확산했고, 이는 반(反)이민이라는 명분의 시위를 일으켰다.
이민자 유입에 반대한다면서 모인 수백 명의 시위대는 가게의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 버스와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 이들은 아버지가 인도 출신인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를 조롱하기도 했다. 시위에 나선 한 아일랜드인은 모든 난민을 몰아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폭동을 옹호했다.
더블린 경찰은 시위를 두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영국 BBC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아일랜드 극우 세력은 의회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등 점차 대담하게 행동해 왔다.
정작 용의자가 이민자였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히려 더블린 폭동에 불씨를 붙인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용감하게 뛰어들어 가해자를 제지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는 브라질 출신 이민자였다. 이는 시위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방증한다. 자신이 아닌 누구더라도 같은 일을 했으리라고 밝힌 이 배달 기사는 반이민 시위에 대해 “나는 이민자이고, 아일랜드인을 보호하려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더블린의 칼부림 용의자가 실제 이민자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민자 혹은 이민자 전체를 향한 폭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다.
한국 교포 학생이 저지른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관련 기사 제목을 ‘범인은 워싱턴 근교 출신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라고만 달았다. 이방인에 대한 구별, 그리고 낙인찍기의 후과를 고려한 결과다. 당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과 교민사회가 보복 폭력사태가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이런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버지니아 공대의 총격을 가지고 다른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행위가 과연 합당한지를, 외국인의 범죄에 외국인 전체의 추방을 말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묻고 싶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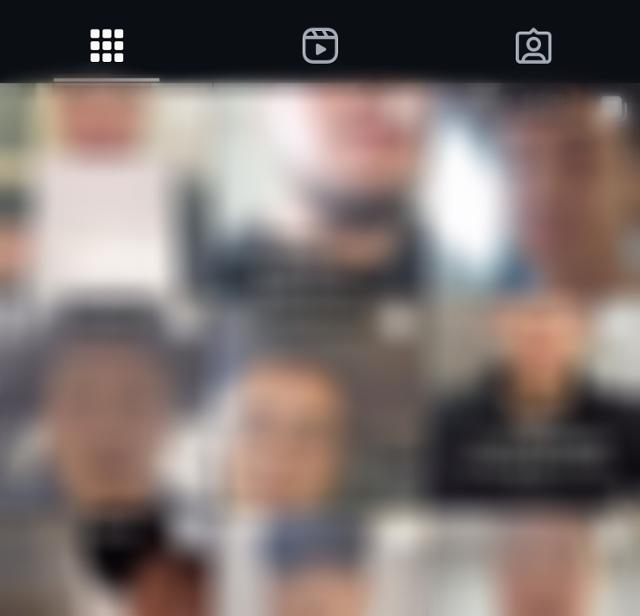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