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36.5℃는 한국일보 중견 기자들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사람의 온기로 써 내려가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사람들이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모차(반려동물용 유아차)'가 '유모차(유아차)'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세상.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분석한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환해 본다. 2013년 10월, 딱 10년 전 기사다. 제목은 '너무나 먼 유아차(A pram too far)'.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저출생 배경을 이렇게 요약했다. "기업은 남성들에게 가혹한 근로 시간을 요구하고 남자들은 집안일을 아내에게 맡긴다. 정부는 남성들에게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10년 동안 우린 뭘 한 걸까.
육아 휴직에 나선 한 한국 남성을 소개한 대목에선 헛웃음이 난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유모차를 미는 그가 백수라고 생각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육아 휴직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고 아내의 부모는 자신의 (일하는) 딸이 '복도 많다'고 여겼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유난히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 육아 문화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제자리걸음이다.
출산 전 나를 생각해보면 나도 할 말은 없다. '널널한' 부서를 골라가며 '마미 트랙(mommy track)'을 밟는 동료를 빈정대던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 아이를 둘이나 낳고 박사학위를 따내던 대학 선배를 흠모하며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던 순진함이 충만했던 시기. 어느새 출산 7년 차, 육아 휴직의 'ㅇ' 자도 상상 않는(못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협량한 아내이자, '애 보는 거 너무 힘들다'는 친정 엄마를 은근히 원망하는 시시한 딸이 돼 있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다.
10년 세월, 역대 정부도 각종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고 수십~수백조 원을 썼다고 한다. 드라마 '안나'에 나오는 말처럼 "세상엔 돈으론 안 되는 게 없는데, 안 되는 게 있다면 돈이 부족해서 아닐까?" 생각해봤다. 맞다. 돈이 부족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저출생 대책을 꼽으라면 전문가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제대로 된 양립'을 꼽는다. 일도 하고 애도 키우려는 부모, 그 부모를 데려다 쓰는 기업들에 제대로 돈을 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예산으로 통용되는 가족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9%)에 크게 못 미친다.
돈 다음은 의지다. 기업은 직원들의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줄여주거나 유연하게 조정해 줄 의지가 없다. 근로자들은 맹렬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대신 좋은 어버이가 되기를 포기당한다. 매일같이 빨래 돌리다 아이 하원 시키기를 자청할 아빠들은 여전히 소수다. 2022년 아빠 육아 휴직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다는데, 그래 봤자 대기업이나 공무원 아빠들 얘기고 이마저도 전체 육아 휴직자 10명 중 3명 정도다.
우리나라에 육아 휴직이 도입된 게 1987년이란 사실이 새삼 놀랍다. 물론 그동안 많이 변했고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미 하버드대 교수도 한국 저출생을 두고 "기성세대와 기업 문화 모두 변해야 한다"고 꼬집지 않았나. 육아 휴직을 결심한 남성이 "출세는 포기?", "애미는 뭐 하고!"란 소리에 '야망 없는 김 과장'과 '남부끄러운 엄마 아들'로 강등되는 사회는 저출생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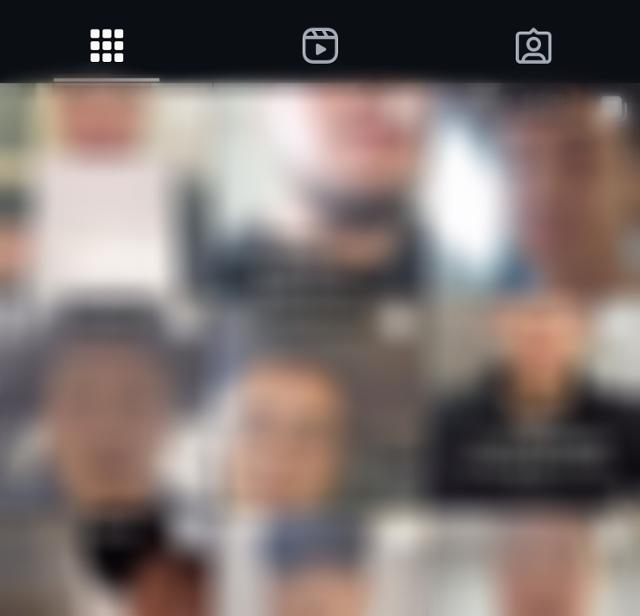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