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역사 이끈 인텔, 다우존스 지수 퇴출
성공에 취해 관료화된 조직이 혁신 걸림돌
미래 얻기 위해선 과거 영광에서 벗어나야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1980~90년대 국내 개인용 컴퓨터(PC) 사용자들은 삼성 LG 삼보 등 제조기업의 브랜드를 그리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다. 대신 ‘286’, ‘386’, ‘486’ 같은 숫자로 컴퓨터 성능을 구분했다.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좋은 최신형이었다. 이 숫자는 컴퓨터에 장착된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 제품에 따라 결정됐는데, 인텔의 80286 CPU가 들어간 것은 ‘286 컴퓨터’, 80386 CPU가 쓰인 것은 ‘386 컴퓨터’였다.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두뇌로, 인텔은 이 제품을 40여 년간 사실상 독점 공급해왔다. 우리에게 친숙한 ‘펜티엄 시리즈’, ‘코어 시리즈’ 역시 인텔의 CPU 제품들이었다. 인텔이 얼마나 빠르고 성능이 향상된 CPU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컴퓨터의 발전이 진행됐으니, 인텔은 컴퓨터의 역사를 지배한 ‘반도체 제국’이었다.
그랬던 인텔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진다는 것은 인텔이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실적 부진으로 2020년 초 2,900억 달러가 넘었던 인텔의 시가 총액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999년 반도체 기업으론 처음으로 다우지수에 편입됐던 인텔의 자리를 차지한 건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다.
인텔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2013~18년 최고경영자(CEO)였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가 지목된다. 그는 원가 절감을 통한 단기 성과에 집착해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해고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인텔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 되는 집’들이 그렇듯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곳곳에서 생긴 구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텔의 발목을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관료화되고 경직된 인텔의 조직 문화는 이미 크르자니크 재임 이전부터 싹터온 문제점이었다. 인텔의 관리자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혁신 경쟁보다는 회사 내부의 예산 확보 싸움에 더 힘을 쏟았다. 중요한 정보도 자기 팀 내부에 쌓아두기만 할 뿐, 다른 부서와 공유하지 않았다. 인텔의 경영진조차 회사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세포 유기체’로 묘사할 정도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조직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PC CPU 시장에서 인텔의 압도적 성공은 새롭게 대세가 된 모바일 반도체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됐다. 인텔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들어갈 반도체 제작을 의뢰했을 때 이를 거절했다. 당초 잡스가 원했던 것은 웹 서핑 정도만 가능한 수준의 작은 칩이었다.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전력 소모도 적은 반도체여야 했다. 하지만 인텔의 반도체는 고성능이고 그만큼 전력 소모도 컸다. 이런 칩은 발열 문제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기 어렵다.
애플이 필요로 했던 저전력·저성능 칩을 만들려면 반도체의 기능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크기도 대폭 줄여야 했는데, 인텔은 단 기간에 이 요구를 맞출 수 없었다. ‘기존 CPU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새 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태동하고 그에 따라 고객의 요구도 변화했는데,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공급자 중심 마인드를 갖게 했고 결국 인텔은 거대한 시장을 잃고 뒤처졌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과거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고 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고, 위기를 맞은 기업이 인텔뿐일까.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첨단 IT업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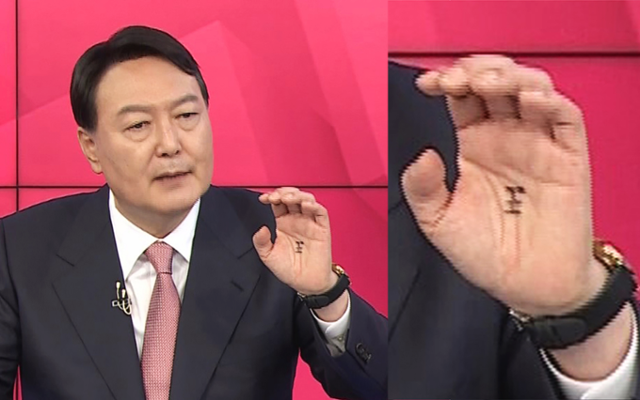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