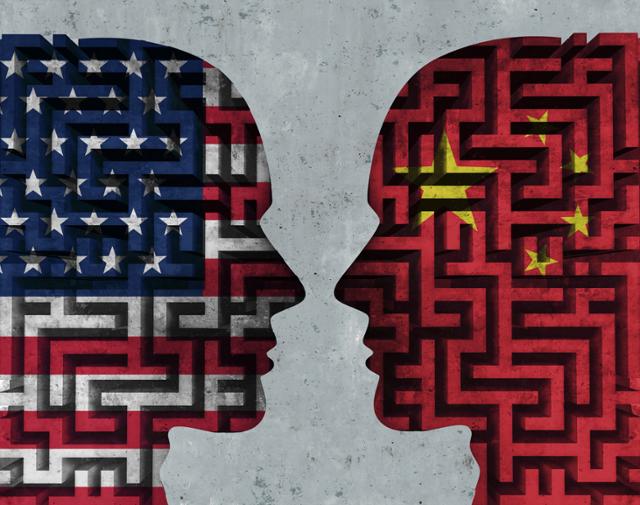
ⓒ게티이미지뱅크
사이가 안 좋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소통 시도를 멈추지는 않고 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월에 바이든·시진핑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했고, 3월엔 앵커리지에서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 비록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전 세계에 보여준 막장 드라마가 됐지만, 그럼에도 7월 다시 중국 톈진(天津)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마주 앉았다. 지난주엔 친강(秦剛) 신임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했다.
이를 보며 일각에서는 미중관계가 “말로는 강경, 실제는 타협”이라는 관전평을 내놓았다. 이는 소위 ’미중관계가 비록 티격태격하지만 싸우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이다‘라는 과거 20세기 미중관계 명품 관측법의 시각을 반영한다.
이 관성적 관측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외교 관리들 스스로가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중관계가 △경쟁 △협력 △적대라는 세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설명해 준다.
그런데 외교 전략은 주식 투자와 같다. 주식 가격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선반영‘한다. 또한 남의 말만 고스란히 듣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 미중관계의 축이 정부 간에는 '협력'보다는 '경쟁'으로 확연히 기울었고, 미국 민간 영역에서는 '적대'가 주류 담론으로 똬리를 틀었다는 점이다. 미중관계를 두고 베팅하는 국가들은 이를 면밀히 봐야 할 것이다.
미중이 여전히 접촉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만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장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이유는, 국력 굴기를 바탕으로 ‘강해진 중국에 미국이 적응하라’며 ‘신시대‘(新?代)를 선언한 중국의 요구를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당헌(黨章)에 포함시킨 ‘신시대‘(新?代)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미국 중심 국제관계의 현상 변경을 국정 방침으로 명기화한 것이다. 이제 시진핑은 “중국은 이미 세계를 평평하게 볼 수(平視) 있게 됐다”며 미중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했지만 세계는 이미 변했다"며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主?适?)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이는 또한 최근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한국이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天下大?, ?之者昌)는 겁박과도 맥을 같이한다.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지만 세계질서의 패권을 두고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경쟁을 하는 미중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힘들다. 현재 미중 양측의 경쟁 대결은 △단순히 무역전쟁 등 경제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의 대결도 넘어섰고 △심지어 더 근본적인 가치관, 세계관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향후 미중 접촉과 협상도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란 현시점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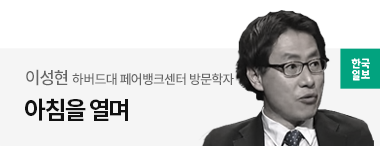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